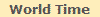






- Total
- General
- Arts
- Book
- Culture
- Economy
- Essay
- Fun/Joke
- History
- Hobbies
- Info
- Life
- Medical
- Movie
- Music
- Nature
- News
- Notice
- Opinion
- Philosophy
- Photo
- Poem
- Politics
- Science
- Sports
- Travel
겨울 병원에서 온 전화가 곤한 잠에 빠진 나를 깨운다. 당직 레지던트에게 치료방침을 지시하고 다시 잠을 청한다. 그러나 정신은 점점 말똥말똥하여져 잠이 오질 않는다. 전에는 전화를 받고도 금새 다시 잠에 빠지곤 했는데 나이 탓인가. 한번 잠을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였다. 아내는 곤히 잠들어 있다. 뒤척뒤척 하다가 아무래도 잠이 오질 않을것 같아 침실을 살며시 빠져 나와 서재로 간다. 애꿎은 콤퓨터만 두들기다가 그도 시들하여 커텐을 열고 창밖 뒷뜰을 내려다 본다. 겨우내 쌓인 눈이 나무 그루터기를 덮고, 희미한 초생달빛은 싸늘하게 눈위에 내려앉아 있다. 심술궂은 바람은 쌓인 눈가루를 이리 몰았다 저리 몰았다 하며 장난질을 치고,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가지가 제법 흔들리는것을 보면 바깥 바람이 꽤 센 모양이다. 유튜브에서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를 골라 틀어놓고 방의 불을 끈다. 얼어 붙은 뒷뜰을 내려다 보며 나 나름의 환상에 빠진다.  |
Comment 7
-
신성려#65
2014.02.01 07:46
-
황규정*65
2014.02.01 09:26
멋지십니다!
사위가 꽁꽁 얼어붙은 겨울 밤중에
깬잠에 연연치 않고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 나그네'를
들으며 지난날들의 상념에 빠져드는---. 규정 -
운영자
2014.02.01 15:16
Beautiful and precious moment ....
유리창밖으로 내다보이는 뒷뜰에 마침 흰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면,
그녀에 대한 그리고 어린 시절의 희미한 먼 추억과 함께
It could have been even more precious. -
민경탁*65
2014.02.01 17:47
몇년전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Winterresier 전곡을 노래 부른다기에 마누라를 따라가 비몽사몽간에 노래를 듯는중
바로 이곡이 나와 벌떡 깨어 들어 보니 바로 그 곡이드군요. 그때까진 이 얘기의 배경을 전혀 몰랏지요
이 노래가 어디서 나왓는지 찾어 보니, Mueller란 사람이 실연한 젊은 남자 악사가 가 겨울에 정처없이 떨돌아다니는 정경을 읊은 詩라고 돼있고'
홀애비 슈벨트가 갑자기 이 시가 마음에 들어 곡을 부쳐 놧다는 얘기도 들엇지요.
노형이 이노래 들으면서 자기전 무슨 환상에 빠졋는지 언제 몰래 얘기좀 듣고 싶고.
보리수 (Der Lindenbaum): 성문앞 우물곁에 서있는 보리수. 나는 그 그늘아래 단꿈을 꾸었네. 가지에 사랑의 말 새기어 놓고서 기쁘나 슬플때나 찾아온 나무밑. 그러나 지금 캄캄한 고요속에 그 곁을 지난다. 차가운 바람이 나의 모자를 날려 보낸다. 나뭇가지는 술렁이며 벗이여 이곳에 그대의 휴식이 있다고 말을 걸어온다.이제는 失戀도 熱戀도 battery가 다 나가서 spark가 않나는 우리세대의 신세를 작시 작곡해줄사람이
언제 나올찌 궁금하고..
눈도 않오고 가뭄이 극심해 호수가 말라가는 이 칼리 포니아 사람의 마음을 달래줄 시인이 언제 나올찌??
처량한 마지막 장면:24. Der Leiermann (The Hurdy-Gurdy Man)
At the end of the village, he finds the old barefoot hurdy-gurdy man, winding away his tunes, but no one has givenhim a penny, or listens, and even the dogs growl at him. But he just carries on playing, and the poet thinks he will
cast in his lot with him. -
방준재*70
2014.02.01 19:38
I can picture of you as a part of movie scenes
or could make a movie out of your song(essay).I'll add a poem "Snowy Night", even though
it might not be related with Chicago Snowy Night;
http://jaypsong.wordpress.com/2013/01/20/the-snowy-night-by-moon-tae-jun/ -
노영일*68
2014.02.02 23:07
Winterreise는 Schubert가 이보다 5년전에 작곡한 아름다운 물레방아간 처녀 (Die schoene Muellerin; 20곡)과 함께
연가곡 (song-cycle) 의 쌍벽을 이루는데,
Schubert 가 Winterreise를 작곡하였을때(1828) 그는 30세 였으며,
질병과 가난과 고독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가 어둡고 슬프다고 합니다.
작곡을 완성한 다음해 3기 매독으로 죽었지요.
가사를 쓴 독일 시인 Wilhelm Mueller 도 같은 시기에 33세로 요절하였다고 합니다.
천재들은 다 요절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두배를 넘어 살았으니 분명 천재축에 끼기는 불가능 하겠지요.? -
조승자
2014.02.03 00:46
노선생님의 "겨울 나그네" 덕분에 로맨틱한 한 겨울밤을 즐겼습니다.
얼어 붙은 호수에 쌓인 눈속에서 강아지와 함께 뒹구는 손주들 모습을
딸에게서 Text message로 받아보며 혹독한 겨울도 즐겁기만 한 젊음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슈베르트, 뮐러의 19세기에는 삶의 고통과 비애가 순수한 젊은 영혼들을 앗아가는
비극의 시대였나 봅니다. 그래서 천재(?)가 발자취만 남기고 요절했는지?
한 겨울밤의 나그네길 음률속에서 지나간 추억을 회고할 수 있음도 축복입니다.
요절하는 "천재"가 아닌 삶을 오래, 오래 즐기십시요.
| No. | Subject | Date | Author | Last Update | Views |
|---|---|---|---|---|---|
| Notice | How to write your comments onto a webpage [2] | 2016.07.06 | 운영자 | 2016.11.20 | 18178 |
| Notice | How to Upload Pictures in webpages | 2016.07.06 | 운영자 | 2018.10.19 | 32325 |
| Notice | How to use Rich Text Editor [3] | 2016.06.28 | 운영자 | 2018.10.19 | 5904 |
| Notice | How to Write a Webpage | 2016.06.28 | 운영자 | 2020.12.23 | 43822 |
| 245 | [Essay] 음악 [10] | 2012.11.10 | 노영일*68 | 2012.11.10 | 3777 |
| » | 겨울 [7] | 2014.02.01 | 노영일*68 | 2014.02.01 | 3777 |
| 243 | Vanity? [16] | 2013.10.28 | 조승자 | 2013.10.28 | 3757 |
| 242 | Classic Music을 살릴려면.... [3] | 2012.11.12 | 운영자 | 2012.11.12 | 3698 |
| 241 | Our Hero, Dr. Martin Luther King, Jr. [2] | 2010.01.17 | 조동준*64 | 2010.01.17 | 3689 |
| 240 | 풍경 [7] | 2012.02.15 | 김창현#70 | 2012.02.15 | 3576 |
| 239 | [Music] The Thorn Birds - Original Sin | 2014.08.20 | 운영자 | 2014.08.20 | 3563 |
| 238 | [Essay] On an Autumn Day (가을날에는) [8] | 2012.11.01 | 김창현#70 | 2012.11.01 | 3553 |
| 237 | [Essay]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6] | 2012.11.12 | 김성심*57 | 2012.11.12 | 3517 |
| 236 | 인턴 [9] | 2013.10.19 | 노영일*68 | 2013.10.19 | 3499 |
| 235 | 마지막 성묘 [8] | 2013.10.31 | 조승자 | 2013.10.31 | 3470 |
| 234 | 마지막 전화 [8] | 2013.11.16 | 노영일*68 | 2013.11.16 | 3442 |
| 233 | 오세윤 수필이 좋은 이유 (펌) [4] | 2011.10.10 | 운영자 | 2011.10.10 | 3410 |
| 232 | 고희 (古稀) [7] | 2014.01.15 | 노영일*68 | 2014.01.15 | 3358 |
| 231 | [김희중 Essay] 죽음의 문턱 [4] | 2014.09.22 | 운영자 | 2014.09.22 | 3275 |
| 230 | [Essay] 내 고향, 가족, 친구, 그리고 孝道에 대해서 [2] | 2012.02.09 | 장원호#guest | 2012.02.09 | 3222 |
| 229 | [Essay] 미뇽이야기 III [9] | 2014.10.04 | 정관호*63 | 2014.10.04 | 3089 |
| 228 | 琴兒 선생의 파랑새 [12] | 2015.01.18 | 황규정*65 | 2015.01.18 | 2824 |
| 227 | [Essay] Rambling (6) [1] | 2013.11.02 | 이한중*65 | 2013.11.02 | 2324 |
| 226 | 김희중 - 고통이 있기에 더욱 찬란한 아름다움 [1] | 2014.09.22 | 운영자 | 2014.09.22 | 2274 |

겨울의 창밖을 내다보면서
노박사님따라서 한순간 즐거운 여행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왼쪽 가슴에 길죽한 흰손수건을 달고 입학했던,
서대문구 금화국민학교를 기억해 냈습니다.
저도 입학은 했지만 육이오로 다니지는 못 했었죠,
서울역에서 기차타고,계속 잤나본데,
"내배 사이소, 내배 사이소..." 하는 소리에
창밖을 내다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세류복?"에 긴 손수건 왼쪽 가슴에 단 단발머리의
계집애가 활짝 웃고있네요.
며칠전에 내린 눈으로
가슴을 설레이던 순간을 다시 떠올리며,
까맣게 잊혀가던 어린시절을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