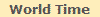






- Total
- General
- Arts
- Book
- Culture
- Economy
- Essay
- Fun/Joke
- History
- Hobbies
- Info
- Life
- Medical
- Movie
- Music
- Nature
- News
- Notice
- Opinion
- Philosophy
- Photo
- Poem
- Politics
- Science
- Sports
- Travel
그리운 나무
사람도 그리운 사람이 있지만, 나무도 그리운 나무가 있다. 나무 중에 품격 높고 아름다운 나무라면, 청순 가련형은 배꽃이요, 시적 낭만형은 매화요, 태고 선인형은 솔이다. 그러나 이런 나무들이 다 그리운 나무가 되는 건 아니다. 미인 역시 마찬가지다. 비록 만인 선망의 대상이긴 하나, 미인이라고 다 그리운 사람일 수는 없다. 그리움은 반드시 나와의 인연을 필요로 한다. 내 나이 쯤 되면 그동안 살면서 그리운 나무가 한 둘 있기 마련이다. 그 나무 생각하면, 그 주변 풍경이 떠오르고. 그리운 사람들이 수채화처럼 자동으로 떠오르는 나무가 있기 마련이다.  진주 신안동 언덕 위에 대밭에 둘러쌓인 삼칸 기와집이 있었다. 우리 큰집이다. 추석에 가보면, 정지 앞 감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감들이 참으로 장관이었다. 먼 길 걸어서 오가던 시절이다. 찰랑찰랑 한 대접 샘물 마시며 바쁘게 눈길이 더듬는 것은 감이다. 어느 놈이 더 익었나. 어느 놈이 더 큰가. 가지 끝에 매달린 감을 비교해가며 입맛 다시곤 했다. 나무에 무수히 달린 감은 내 마음을 한없이 행복하게 하였다. 배건너 우리집에 있던 것은 떫은 감나무 였다. 그러나 가을이면 홍시가 볼만했다. 잎 떨어진 가지와 홍시에 앉은 하얀 서리가 참으로 아름다웠다.깍깍 까마귀는 날아와 우짖었고, 홍시는 늦가을이 될수록 맛이 절정에 이른다. 차급고 농익은 그 맛은 제호(醍醐)를 앞선다. 석양에 보아도, 달밤에 보아도 아름다운 것이 홍시다. 대문 안에 감나무 있는 아이는 행복한 아이였다. 두번째 그리운 나무는 푸라타나스다. 소년 때 여름방학은 할 일이 없었다. 친구들은 모두 시골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나는 말못하는 매미와 고추잠자리와 놀 수 밖에 없었다. 넓은 교정을 찾아갈 수 밖에 없었다. 거기에 큰 푸라타나스 나무가 있었다. 푸라타나스 밑은 하루 종일 그늘이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나는 그 그늘에 쉬는 한마리 양이었다. 논의 자운영도 곱고, 공터의 크로바도 고왔다. 논가의 뜸부기 소리도 듣고, 나무 속 뻐꾸기 소리도 들었다. 나는 꽃에 날아다니는 벌과 나비와 하염없이 놀았다.씰룻씰룩 씰룩대는 쓰르라미, 맴맴 우는 매미 소리 들으며 한 여름을 보냈다. 황혼은 떼지어 다니는 고추잠자리 군무 속에 흘러갔다. 나는 푸라타나스 품에 찾아온 한마리 딱다구리 였다. 나무 아래서 풋잠에 들기도 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싱싱한 푸라타나스 향기를 맡기도 했다. 나무로 올라가는 개미를 입김으로 골리기도 했다.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뭉게구름도 나의 친구였다. 면사포같은 구름, 명주실 같은 구름, 목화 같은, 모든 구름이 나의 친구였다. 하늘은 구름이 날라다니는 도화지 였다. 나무잎은 푸르렀고 흰구름은 아름다웠다. 간혹 책을 가져갔지만, 나는 책보다는 매미소리를 유심히 들었다. 고추잠자리를 더 오래 보았다. 꽃을 오래 보았고, 벌과 나비의 춤을 더 오래 감상했다. 싱싱한 푸라타나스 잎을 흔들던 시원한 바람을 즐겼다. 나는 거대한 푸라타나스 밑에서 자연을 배웠다. 그리고 고향 떠난지 50여년, 이제 노인이 되었고, 할 일이 없다. 출근할 일 없어 영원한 방학을 맞았다. 자식들 분가했으니, 집안도 조용하다. 간혹 새벽에 일어나서, 은퇴 후는 자연을 관조하며 살아야 한다고 다짐한다. |
Comment 12
-
김성심*57
2012.07.14 01:39
-
이한중*65
2012.07.14 02:13
김창현 님,
시골에서 열다섯살까지 자라난 나로서 김창현 님의 서정시적인 구절구절
나의 心琴(심금)을 울려와 나의 옛날 고향집으로 달려가게 해줍니다.
우선 생각나는것은 우리집앞에 우리동네에선 제일크고 하나밖에 없던
어마어마하게 커 보였던 푸라타나스 나무와 뒷동산에 왕밤나무들 그리고
집앞 퍼져나가는 큰 들벌판, 논 옆 길가에 여름이면 농부들이 그늘밑에서
점심들 먹던 크디큰 수양버들나무가 머리에 떠오릅니다.김창현님의 아름다운 꿈과 같이 행복한 유년시절을 축하드립니다.
많이 즐겼읍니다. -
황규정*65
2012.07.14 02:30
감나무하니 이사람에게도 생각나는 감나무들이 있네요.
육이오가 한창일때 우리는 충청남도에 살아서인지 그렇게 혹독한 기억은 없고
사는곳에서 더깊숙히 깊숙히 피난가다보니 큰누님이 사셨던 충남 한산에서 얼마
동안 머문적이 있었다.그곳 주위 산비탈에는 감나무들이 즐비하게 있었는데 수없이 많은 '대접감나무'
에서 익어 땅에 떨어진 감을 줏기위해 동네애들간에 경쟁이 붙었었다.잘익은 대접감은 맛도 맛이지만 10살백이 어린눈에는 너무신기하고 보기좋아
새벽잠도 설치며 나가서 줏어오곤했다. 잠도 설치는 어린동생이 안스러웠던지
아니면 어린나이에 너무 지지 않을려는 마음을 다독거려 줄려는지 큰누님이
'익은감들이 집에 많으니 내일은 푹자거라'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내마음속에 남아있다.좋은글에 감사드립니다. 규정
-
김창현#70
2012.07.14 02:50
김성심선배님의 글을 대하면 ,그때마다 참 아름답고 교양있는 숙녀시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한중 선배님. 즐급게 읽어주시어 참으로 감사 합니다.
하찮은 글을 읽고 같이 유년시절을 생각해주시어.
정다운 고향 그림을 넣어주신 운영자님 ! 매번 감사합니다.
-
김창현#70
2012.07.14 03:01
황규정 선배님! 선배님은 새벽 잠도 안자고 감을 따오셨군요. 그 말씀 참으로 공감이 옵니다.
저는 새벽에 풀섶에 떨어진 홍시 줏어먹던 달콤한 기억이 되살아 옵니다. -
노재선*66
2012.07.14 09:15
"그리운 나무"
나도 모르게 읽고 또 읽었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으며, 그리고 감나무가 있는 초가집을 보면서 네번이나 읽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랐던 감나무가 있고
큼직한 프라타나스 나무가 있던그립든 고향으로 돌아가 봅니다마지막에 쓰신, 이제는 노인이 되었고 자연과 함께 보낸다는 표현은
내가 하고 싶었든 말들이라고 하고 싶군요
멋진 표현으로 그리운 나무를 올리신 김창현 님에게
흐려저 가는 추억속에서 옛적을 생각게 하는 글에 감사를 한아름 보냅니다 -
김창현#70
2012.07.15 01:24
노재선 선배님 네번이나 읽어주셨다니.... 하찮은 글이나마 올린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
방준재*70
2012.07.15 05:43
Please, don't be shy, or humble, Ghym do-sa-nim.
You're a good Essayist and you hit the nail
right on the head - which is Nostalgia to all
of us, the core of emotion living as Immigrants
for so long, away from our hometown and got old.
Alas! -
김창현#70
2012.07.16 00:03
방박사! 늙어가면서 더 그리워지는 진주 이야기 좀 했네.
우리 큰집이 있던 신안동은 아파트촌이 되었으니,그 감나무 없어졌고,
진주농고에 있던 그 푸라타나스도 어떻게 변했는지..크로바 자운영은...
-
방준재*70
2012.07.16 01:14
I hope you read
Milan Kundera's, Czech novelist,
"Ignorance(1999)", if you didn't read.Nostalgia?
It's painful, because it's out of our Ignorance
- We don't know what's going on over there,
Nor changes people and places made.Missing people and places followed Disappointment
And Irena went back to Paris
Where she lived, not staying in her Motherland
- Czechoslovakia after she visited. -
계기식*72
2012.07.16 15:59
제 어렷을 적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제 주변에는 감나무 같은 것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배님의 글을 통하여 즐거운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제가 은퇴한 후에는 운영자 선배님을 비롯한 미국에 사시는 선배님들처럼 살고는 싶은데,
저는 등산과 골프에 취미와 특기가 없어서 그 점은 다른 삶을 연구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창현#70
2012.07.17 11:29
계선생님! 어렸을 적 감나무 말고도 즐거운 기억이 있을 겁니다.
찬찬히 살펴보시면 인생은 아름다운 일의 연속이고...
고맙고 감사한 일의 연속이라 생각합니다.
| No. | Subject | Date | Author | Last Update | Views |
|---|---|---|---|---|---|
| Notice | How to write your comments onto a webpage [2] | 2016.07.06 | 운영자 | 2016.11.20 | 18191 |
| Notice | How to Upload Pictures in webpages | 2016.07.06 | 운영자 | 2018.10.19 | 32338 |
| Notice | How to use Rich Text Editor [3] | 2016.06.28 | 운영자 | 2018.10.19 | 5914 |
| Notice | How to Write a Webpage | 2016.06.28 | 운영자 | 2020.12.23 | 43833 |
| 165 | 금발의 제니 [6] | 2012.10.10 | 노영일*68 | 2012.10.10 | 4773 |
| 164 | [Essay] 나는 심부름 왕 [1] | 2012.09.21 | 석동율#Guest | 2012.09.21 | 3872 |
| 163 | [Essay] 줄리오 [11] | 2012.09.16 | 노영일*68 | 2012.09.16 | 5341 |
| 162 | 손녀 [12] | 2012.08.28 | 노영일*68 | 2012.08.28 | 5467 |
| 161 | 이명박대통령의 일본천황 사과요구에 일본이 발끈하는 이유 [3] | 2012.08.16 | 김이영*66 | 2012.08.16 | 4972 |
| 160 | 무궁화에 대한 斷想 [6] | 2012.08.12 | 김창현#70 | 2012.08.12 | 7535 |
| 159 | 구름 [7] | 2012.08.04 | 김창현#70 | 2012.08.04 | 4462 |
| 158 | 강변에 살자더니... [7] | 2012.07.31 | 운영자 | 2012.07.31 | 4763 |
| 157 |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3] | 2012.07.31 | 장원호#guest | 2012.07.31 | 4229 |
| » | 그리운 나무 [12] | 2012.07.13 | 김창현#70 | 2012.07.13 | 4982 |
| 155 | Health care in Canada (Excerpt from Wikipedia) | 2012.07.08 | 이상열*65 | 2012.07.08 | 2068 |
| 154 | An experience with British Medical System [6] | 2012.07.07 | 이상열*65 | 2012.07.07 | 1991 |
| 153 | 고엽(枯葉) [2] | 2012.06.24 | 김창현#70 | 2012.06.24 | 4073 |
| 152 | 금강경을 읽으면서 [4] | 2012.06.18 | 김창현#70 | 2012.06.18 | 4327 |
| 151 | 나의 성당, 나의 법당 [3] | 2012.05.23 | 김창현#70 | 2012.05.23 | 5389 |
| 150 | 모란 [7] | 2012.05.20 | 노영일*68 | 2012.05.20 | 5957 |
| 149 | 망진산 [10] | 2012.03.16 | 김창현#70 | 2012.03.16 | 4365 |
| 148 | Anton Schnack, his life <k. Minn> [4] | 2012.03.07 | 민경탁*65 | 2012.03.07 | 18135 |
| 147 | 친구들아! [17] | 2012.03.04 | 황규정*65 | 2012.03.04 | 5754 |
| 146 | [re]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 안톤 슈낙 [6] | 2012.03.03 | 황규정*65 | 2012.03.03 | 6416 |

김창현 선생님,
그 나무 밑 온갖 자연의 숨쉬는 것들의 미미한 곳까지 살피시며 여름을 즐기시는 소년은 자연의 교향곡의 지휘자이신듯 합니다.
글 중에서 그 단락이 교향곡의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있으면서요.
'감이 고향의 시'라고 하셨지요. 순간 떠오르실 고향의 감회를 가히 짐작하게 됩니다.
8.15 해방직전 중1에 입학하여 '京城の 五月'라는 글을 日本語讀本(당시에는 감히 國語讀本이라고 하였지요)에서 배웠습니다.
그 글에서 푸라타나스 나무 얘기가 첫머리에 나오면서 서울의 남산부근 자연속 여러 새들, 식물들의 묘사가 많이 나왔던 것을
지금 연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낭낭하셨던 여자 일인, 奥村先生님 생각도 생생합니다.
저에게 그리운 나무라고 하면 중3에서 대학졸업하도록 자란 서울의 상도동 집에 봄이면 피던 꽃중에
가장 평화롭고 아름답게 느껴졌던 옹매화나무가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봄마다, 시험공부하면서도 가끔 창가에서 내다보며 답답한 숨을 고르곤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옹매화는 저의 소녀시절의 꽃이 되어 그때 그 식구들이 그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