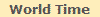






- Total
- General
- Arts
- Book
- Culture
- Economy
- Essay
- Fun/Joke
- History
- Hobbies
- Info
- Life
- Medical
- Movie
- Music
- Nature
- News
- Notice
- Opinion
- Philosophy
- Photo
- Poem
- Politics
- Science
- Sports
- Travel
 군 불 김창현 탁탁! 불똥 틔며 타오르는 장작불 피우기는 재미였다. 오직 재미 있었으면, '아이들이 불장난하면 자다가 이불에 오줌 싼다'는 금기어까지 생겼을까. 불길은 혓바닥 일렁거리며 장작을 태우다가, 새 장작에 금방 옮겨붙는다. 소나무 장작에선 짙은 송진향이 풍긴다. 작대기로 장작불 뒤척이거나, 갈비를 한 줌 던져주면 확 하고 소리내며 타오른다. 그때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기운이 몸을 뜨겁게 달궈주곤 했다. 얼굴 빨갖게 달아오르게 만들곤 했다. 간혹 바람 불어 매운 연기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솥뚜껑은 쉭쉭 소리를 내며 하얀 김을 내품었고, 탕수국 냄새는 사방에 퍼졌다. 국 끓고 나면 잿불을 화로에 담아 대청에 가져간다. 설 추위에 두루마기 입고 큰집 대청 끝에 늘어선 남정네들 손 녹이기 위한 것이다. 이 군불 때던 임무는 스무살 전후 상경한 후 사라졌고, 아련한 향수는 허공 속에 묻혀졌다. 그래 2년 전에 친구가 지리산 두류동에 초막을 만들 때, 내가 맨 먼저 권한 것이 난로를 하나 놓아보란 것이었다. 농사 짓던 사람도 아니고, 시카고서 귀국한 친구다. 해발 500고지 산속의 바람소리 들리는 쓸쓸하고 긴긴 동지밤에 혼자 방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쉬운대로 밤 고구마 구워가며 지내는 것이 낙일 것 같아서다. 그래서 즉시 중고 난로 하나 구해 놓았더니 두가지 낙이 있더라 한다. 첫째는 겨울 난방비가 백만원 줄었다는 것이다. 산에 지천인 것이 나무다. 나무를 해다 때니 경유가 적게 든다는 것이다. 운동도 된다는 것이다. 영하 10도 15도를 기록하는 그곳 난방비 백오십만원이 50만원으로 확 줄었다는것이다. 둘째는 운치 있다는 것이다. 눈 내리는 산속의 난로불도 운치요, 고구마나 밤 굽는 재미도 운치더란 것이다. 마침 그 난로에는 고구마 굽는 칸까지 따로 있다고 한다. 난로를 같이 구해온 진주 오교장과 둘이, 난로 놓자 눈 온다고, 글 쓰는 자네 오면 좋겠다고, 서울로 전화해서 같이 웃은 적 있다.  10년만에 남에게 세줬던 집에 다시 오니, 이 집은 전에 내가 산 10년 세월까지 합하면, 20년 넘은 낡은 집이다. 마당의 향나무가 하도 무성해 다른 나무들과 함께 잘라서 묶어놓으니, 큰 짐이 열개나 된다. 이걸 차 불러 쓰레기장에 보내려면 적잖은 돈이 든다. 도시는 이런게 탈이다. 차일피일 치우기 미루다가 마침 영하 15도가 넘은 날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다. 나이 70 바라보는 이제 벽난로 불 피웠다고 이불에 오줌 쌀 일 있겠는가. 마음 놓고 고향집에서 군불 때던 시절을 회상해본다. 일렁이며 피어오르는 불꽃 바라보고 있노라니, 그 불꽃 속에 연날리기 하던 시절, 춥다고 들불 쬐던 일 떠오른다. 정월대보름 타오르던 달집 생각난다. 양은도시락 얹어놓던 교실의 따끈하던 난로 생각난다. 지난 날의 향수가 어딘가서 밀려온다. |
Comment 7
-
민경탁*65
2012.01.29 18:06
-
운영자
2012.01.29 19:02
본인도 어릴때 충청도 예산군 삽교리의 어느 촌 마을에서 군불때던 생각이 납니다.
때로는 매운 연기에 눈물도 흘렸지요. 얼굴은 뜨거움에 붉어지는데 등은 싸늘했었지요.
이 글을 읽으며, 그때의 추억이 간절하게 연상됩니다.
그때 군불앞에 앉어있던 작은 소년이, 지금 Colorado의 밤중에 computer 앞에 앉어있으니,
대관절 무슨 우여곡절인지, 아니면 무슨 기구한 운명의 장난인지 알수없군요.
그 이후, 60년의 인생살이가 가져온것이겠지요.하여간 눈내리는 조용한 깊은 겨울밤에 본인의 가슴을 훈훈하게 만들어줍니다.
Thank you !! -
김성심*57
2012.01.29 22:58
군불! 한참 잊었던 단어입니다.
아궁에 불을 지피면 밥을 하던지 국을 끓이든지, 아니면 소여물 쑤고, 양잿물 빨래등 가마솥에 뭔가 들어 있어
겨울에는 방 구들도 덥고 아궁 불이 이중으로 활용되는데 군불이란 방이 식으면 불을 지피게 되는 것이었지요.
그 때는 가마 솥에는 물을 가득 넣고 덥히게 될 것이지요.땔감들이 우지직 탁탁 불붙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옵니다.
한참 불길이 성하면 가끔 젖은 장작도 섞어 때기도 하고 글에 올리신 송진이 타면 그 향기 그윽하지요.나의 아버지의 소년시절까지 계시던 고향 사람들의 시골집,
그리고 시댁에 갓 시집가서 아궁에 불 지피는 정경이 되살아나며 우리 조상들의 삶을 그립니다. -
조승자#65
2012.01.30 03:30
오래 잊고 있던 단어와 정경을 눈에 보이듯 묘사하셨습니다.
연탄세대들도 시골의 장작 군불 정경을 그리워하며 향수를 느끼지요.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아름다운 글입니다. -
운영자
2012.01.30 04:11
그리고 다음날 아침....
군불에 덮혀진 물을 대야에 받어서,
마당에 쭈그리고 앉어서 세수를 했지라우.
엊그제 같은데 말이여.... -
황규정*65
2012.01.30 05:07
군불은 지금세대는 느끼지 못하는 우리세대에게 있는
아득하고 아련한 향수같은 것이기도 합니다.'바깥 남정내가 갑짜기 친절하게 군불 때주면 바람나지
않았나' 조심하라는 옛말도 다 그만큼 군불이 우리생활에
그만큼 밀접했다는 말이겠지요. 규정
-
김창현#70
2012.01.30 11:54
운영자님! 군불을 땔 때, 얼굴은 뜨거움에 붉어지는데 등은 싸늘했다는 이야기,
군불에 덮혀진 물을 대야에 받어서,
마당에 쭈그리고 앉어서 세수를 했다는 이야기,
생생한 그런 경험이 있어 깊은 공감이 갑니다.
민경탁.김성심,조승자,황규정 선배님! 즐겁게 읽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 No. | Subject | Date | Author | Last Update | Views |
|---|---|---|---|---|---|
| Notice | How to write your comments onto a webpage [2] | 2016.07.06 | 운영자 | 2016.11.20 | 18193 |
| Notice | How to Upload Pictures in webpages | 2016.07.06 | 운영자 | 2018.10.19 | 32345 |
| Notice | How to use Rich Text Editor [3] | 2016.06.28 | 운영자 | 2018.10.19 | 5922 |
| Notice | How to Write a Webpage | 2016.06.28 | 운영자 | 2020.12.23 | 43838 |
| 145 | 은주의 노래 [2] | 2012.02.29 | 김창현#70 | 2012.02.29 | 6118 |
| 144 | 노을과 화약연기 [5] | 2012.02.27 | 조만철#70연세의대 | 2012.02.27 | 13574 |
| 143 | 일기 (日記) [6] | 2012.02.22 | 노영일*68 | 2012.02.22 | 4714 |
| 142 | 이효석씨의 글과 그의 약력을 읽으면서 [10] | 2012.02.21 | 운영자 | 2017.05.31 | 3994 |
| 141 | [re] 낙엽을 태우면서 / 이효석 [7] | 2012.02.21 | 황규정*65 | 2012.02.21 | 4433 |
| 140 | 나무를 태우면서 [12] | 2012.02.20 | 김창현#70 | 2012.02.20 | 4534 |
| 139 | 풍경 [7] | 2012.02.15 | 김창현#70 | 2012.02.15 | 3576 |
| 138 | [Essay] 내 고향, 가족, 친구, 그리고 孝道에 대해서 [2] | 2012.02.09 | 장원호#guest | 2012.02.09 | 3222 |
| 137 |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15] | 2012.02.07 | 황규정*65 | 2012.02.07 | 4001 |
| 136 | 명의 (名醫) [12] | 2012.02.03 | 노영일*68 | 2012.02.03 | 4721 |
| 135 | Shall We Dance? - At Last ! [3] | 2012.02.03 | 운영자 | 2012.02.03 | 4396 |
| » | 군불 [7] | 2012.01.29 | 김창현#70 | 2012.01.29 | 5441 |
| 133 | 클래식이여 안녕! [5] | 2012.01.24 | 김창현#70 | 2012.01.24 | 11864 |
| 132 | 꿈 [7] | 2012.01.21 | 김창현#70 | 2012.01.21 | 5213 |
| 131 | 선물 [11] | 2012.01.01 | 노영일*68 | 2012.01.01 | 4239 |
| 130 | 言行一致 [9] | 2011.12.31 | 황규정*65 | 2011.12.31 | 5291 |
| 129 | 또 한번 년말을 보내며 [3] | 2011.12.27 | 김창현#70 | 2011.12.27 | 6186 |
| 128 | 지하철 속의 아베마리아 [6] | 2011.12.15 | 김창현#70 | 2011.12.15 | 7592 |
| 127 | [수필] 바람이 주는 말 - 정목일 | 2011.12.06 | 운영자 | 2011.12.06 | 6485 |
| 126 | 이방인 [4] | 2011.11.24 | 노영일*68 | 2011.11.24 | 5339 |

저희 집에도 벽난로가 있는데 장작 두개만 넣으면 저녁 내내 따스하지요.
한국의 온돌은 굴둑에서 찬바람이 나오니, 열을 100% 방바닥에 내어 놓고 열이 오래가는 나오는 가장 효율적인 난방 법인데,
방공기 처음 빨리 덮히느데 시간이 오래걸리는게 문제,..
생각해서 빨리 덮힐때는 난로로 통해가게하고 조금있다가
고래로 지나가게하면 되는데,..
조금 머리 쓰면 될
해결될 문제 같은데, 아직 겸용 (온돌/ 벽난로) 나오지 않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