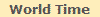






- Total
- General
- Arts
- Book
- Culture
- Economy
- Essay
- Fun/Joke
- History
- Hobbies
- Info
- Life
- Medical
- Movie
- Music
- Nature
- News
- Notice
- Opinion
- Philosophy
- Photo
- Poem
- Politics
- Science
- Sports
- Travel
망진산
병풍처럼 깍아지른 절벽에선, 발 아래 남강 물줄기와 신안리 들판이 손금 들여다보듯 보인다. 멀리 100리 밖에 있는 토끼 귀처럼 생긴 지리산 두 봉우리도 보인다. 강 건너 절벽은 서장대다. 두 절벽 사이에 비단띠마냥 휘돌아 흐르는 강이 남강이다. 신안리 들판은 밟아도 밟아도 부드러운 모래흙이다. 지리산 눈 녹은 물 흐르는 봄이면 버들강에 은어가 올라오고, 가을이면 만장같은 황금 들판 나락을 안고 메뚜기가 톡톡 튀었다. 나는 모험한다고 진도개를 데리고 그 절벽을 오르내리곤 했다. 절벽 가운데서 흙에 반쯤 묻혔던 도자기를 발견한 적 있다. 절벽 중간에 굴을 파서 혼자 살 궁리를 한 적 있다. 아무도 못가는 절벽의 산나리꽃, 패랭이꽃 찾아다닌 적 있다. 어떤 소녀를 위해 암벽에 시를 새긴 적 있다. 서장대서 바라본 망진산과 남강 내가 살던 망경남동서 바라보는 망진산은 여성처럼 부드러운 산이다. 절이 있고, 과수원이 있다. 산그늘이 숨긴 거울같은 못이 있고, 나지막하게 층을 이룬 계단식 밭이 있다. 어머니 따라 절에 가곤 했다. 절엔 '해탈이'라는 고양이가 있었다. 절 올라가는 길 옆 복숭아꽃은 시골 새댁처럼 항시 순결하고 고왔다. 습천못은 빨간 고추잠자리와 고동을 잡던 곳이다. 대를 쳐서 붕어를 낚던 곳이다. 망진산은 봄이면 오리나무 가지끝에 움트는 새잎이 신비로웠다. 여름이면 언덕 위의 흰구름이 좋았다. 가을이면 빨간 홍시가 탐스러웠다. 겨울이면 계곡에 얼어붙은 고드름이 신비로웠다. 지지배배 아지랑이 속의 종달새, 인적 없는 골짜기 메아리, 대밭의 산비둘기소리, 비온 뒤 졸졸거리던 또랑 물소리는 전원교향악이었다. 절벽 틈에 핀 노란 원추리, 바위 틈에 핀 붉은 석죽화, 무덤 옆 할미꽃, 보리밭 가 하얀 찔레꽃, 대밭의 보라색 칡꽃, 언덕을 수놓던 벚꽃, 과수원집 담에 얼굴 붉히고 선 석류나무는 아름다운 색의 향연을 내게 가르킨 미술선생님들 이다. 보라빛 고구마꽃, 하얀 도라지꽃, 민들레, 크로바, 진달래, 개나리는 보조선생님 이다. 산은 나에게 덤으로 비밀 선물을 준 적 있다. 비 갠 산의 황홀한 무지개. 면사포처럼 하얀 남강의 신비한 새벽 안개가 그것이다. 나는 매일 산에 올랐다. 산을 내려와 강에 몸 씻고, 아침 먹고 다리를 건너 학교엘 갔다. 나는 단석산에 들어가 무예를 딱은 김유신 장군을 생각했다. 망경산을 한번도 쉬지않고, 뛰어서 오르내리는 단련을 했다. 왕복 한시간 걸리던 산을 30분만에 주파할 수 있었다. 능선 잔솔밭은 높이뛰기 대상이다. 일미터 남짓한 잔솔을 매일 뛰어넘으면, 나중에는 그 나무의 키가 수십장 되어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었다. 계단식 밭은 넓이뛰기 대상이다. 새처럼 활공하여 밭둑을 뛰어내렸다. 축지법 책을 읽기도 했다. 그 덕택일 것이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 백미터, 높이뛰기, 넓이뛰기, 3단조 등 전 육상종목 선수를 지냈다. 산은 소년의 신체를 단련시키고, 담력과 정서를 키워준 스승이었다. 누구에게 말못할 이야기를 경청해준 친구였다. 열 다섯 사춘기 감성을 받아준 애인이었다. 그리고 떠나온지 50년 세월이 흘렀다. 소년은 이제 노인이 되었다. 머리에 백설을 이고 진주에 가면 노인을 알아보는 사람 드물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소년 때 친구들 소식도 아득하다. 노인은 이제 고향에서도 나그네인 것이다. 그럴 때 노인은 망진산에서 위로를 받는다. 살갑던 그 시절 동무들은 모두 떠나갔지만, 산이 남아있어 안도감을 느낀다. 산은 자기 품에서 헷세와 투루게네프의 작품을 즐겨 읽던 그 소년을 아마 알아볼 것이다. 이제 습천못은 메워져 새 동네로 변했다. 정상에 돌로 축조한 웬 낮선 봉수대가 새로 섰다. 그러나 '강산이 다섯번 변하는 세월에 그 정도 변화야 없을손가.' '세월 속에 사람도 얼마나 많이 변하던가.' 노인은 속으로 망진산 편을 든다. 과연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 데 없다'는 말이 옳다. 노인은 속으로 몇번씩 되뇌인다. |
Comment 10
-
민경탁*65
2012.03.16 17:59
-
운영자
2012.03.16 18:19
사람마다 자기 고향의 산이 영원히 맘속에 남아있는듯합니다.
창현 님의 산이 망진산인것 처럼, 본인의 고향의 산은 강원도의 大岩山이지요.
향로봉 서쪽, 설악산의 서북쪽, 625의 Punch Bowl의 남쪽 벽을 이루는 산입니다.
양구군과 인제군 사이의 높은 능선위에 있는 산으로 늦가을과 늦봄까지 눈이 덮혀있는 1300 meter의 정상이지요.
아마 5살되던 이른 봄에 아버님과 같이 밭에 나갔다가 문득 눈에 뜨였던 하얀 눈 덮힌 정상입니다.
고향 떠난지 60년만에 돌아가서 어릴때 쳐다만 보던 정상에 올랐었지요.
이 글에서 처럼 백발의 노인으로 돌아간 고향에는 아무도 남아있지않고 옛날의 집터조차 보이지 않었지만
그 산은 그대로 남아있더라구요.대암산 동쪽 산기슭의 이름없는 묘지에 묻혀있는 어릴때 죽은 동생을 생각해 보았지요.
다시 돌아 올수있을가도 생각했지요. 그것으로 아마 고향을 마즈막으로 본것이 될것 같습니다. -
민경탁*65
2012.03.16 18:58
자세히 보니 유성으로 가는 음지말 근체에 물레 방아간이 있엇는데,
이효석의 메밀꽃 무렵 얘기에 나오는 물레 방아간 갔은 정미소그자리에 아직도 정미소가 서있군요.
좌우에 물길이 있든 자리가 뚜렷히 보이고..
옛날엔 초가엿는데, 이제는 함석 판 지붕으로 둔갑햇고
논 갈든 소는 없어졋고
트랙터가 눈에 보입니다. -
김창현#70
2012.03.17 01:03
민선배님! 구봉산에서 보는 갑천이 참 !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군요. 작은 섬을 돌아가는 그 모습이 환상입니다.
운영자님! 제가 속초에 강의차 일주일에 한번씩 가면 인제 양구 그 길도 간혹 다녔습니다. 호수를 낀 그곳
경치가 참 좋지요. 요즘은 드라이브길이 잘 되어있고 멋진 팬션도 있어서 마치 외국 풍광 같지요
방박사! 이젠 첫사랑도 어디 외지로 가버린 진주에 가면, 모든게 꼭 이 노래 가사 같다네.It's lonesome old town. -
방준재*70
2012.03.17 05:46
But Memories are Alive. -
황규정*65
2012.03.17 11:43
'망진산'의 望晉은 진주를 바라본다는 뜻이 되네요.
강이다 호수다하며 주위에 물은 지천으로 있지만 차로 몇시간을
달려도 산을 볼수없는 그런곳에 40년을 넘게산 이사람에게는
앞뒤로 둘러싼 고국의 산들에 향수같은 그리움이 있습니다.곧 봄이오면 더해지겠지요. 규정
-
민경탁*65
2012.03.17 12:10
김형:
형의 붕어얘기를 들으니, 옛 기억이 꼬리를 물고 지나갑니다.
어렷을때, 논 근처에 있는 조그만 둠벙 (연못)에 붕어가 노는데, 그 놈을 잡으려고, 햇지만
낙시대할 대나무, 명주실, 낙시바늘이 없는 터라..
왜냐하면 저의 집은 돌바닥이 대지라 대나무가 없어 천상 남의 집에가서 얻어와야되는데, 그것도 재산이라 아무한테나 주지를 않아 할아버지가 특별이 사정해서 하나 구해놓고, 몀주실도 구하고,
낙시 바늘도 그때는 하나 사려면, 십여리를 걸어가야햇고, 결국은 다 장만햇는데,
같은 물구멍에 찾어가니 이제는 붕어가 없어졋어요..
결국은 다른 애들하고 긴 논물길 양쪽을 막어서 그속에들어온 붕어가 아닌 시어를 모두 잡아온 기억이있지요.
칠순이 다된 이 지음 1000 여평 연못도 생겻고, 대나무 숲도 생겻고
조기 만한 물고기 연못에 엄청 많으니,
손자놈이 대 여섯살 되면, 어릴적에 이루지 못한 소원을 풀어 볼가 생각 중이지요.
이 연꽃 아래로 물고기가 많이 찾아올때를 기라 림니다
금년에는 늦게 장마가 와서 물은 풍부할거 갔읍니다.
-
김창현#70
2012.03.17 12:11
황선배님! 반가운 지적입니다. 원래 산이름이 望晉山 望京山 두개 입니다.
거기서 봉화로 서울에 연락했다고 망경산. 그런데 타향에 오래 살다보니,진주를
그리워 한다는 망진산이 이젠 더 어필해오더군요.
글 말미에 이걸 붙였다가 사족인거 같아 삭제해버렸습니다.수석하는 분들이 최고의 경지에 들면, 울퉁불퉁한 산수경석에서 편편한 평원석으로
무한한 묘미를 본다고 하더군요. 저도 작은 평원석을 가지는 것이 소원입니다.
.미국의 그 아름다운 평원도 수석으로 보면 최상급이거니 하고 보셔도 될듯 합니다. -
김창현#70
2012.03.17 12:54
민선배님 천여평 연못 참 부럽습니다. 연못에 조기만한 물고기 엄청 많다니 더 부럽습니다.
이 참에 붕어찜 소개하겠습니다.
식도락을 즐기던 전라도 친구가 하는 말이 생선 중에서 진짜 깊은 맛은 민물생선이고,
민물생선 중에서도 붕어와 잉어찜이 최고라고 합니다.
밑에 시래기와 무우를 깔고, 붕어를 칼집을 내고 취향대로 양념을 하고,민물새우 좀 넣고,
압력밭솥에 푸욱 쪄내면 뼈까지 물렁물렁해져서 다 먹습니다.
서울 근방은 강화도 근처, 퇴촌 근처 붕어찜이 유명하고, 소양호 붕어는
깨끗해서 좋은데, 가장 별미는 변산반도 가는 길 부안 붕어찜 입니다.
호수밑이 황토라 황토내가 물씬 나는게 진짜지요.
부안 호수에 연꽃 구경하면서 막걸리 한잔에....월척 붕어찜붕어
어린시절 붕어는 너무나 흔한 물고기였기에 그리고 가시가 너무 많아서 그리 좋아하던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릴라의 머리속에 붕어란 존재는 그냥 몸보신용 붕어즙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처음으로 먹어본 붕어찜이 짜장붕어를 이용한 붕어찜이어서 불쾌한 냄새가 나서
다시 먹을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음식입니다. 낚시를 즐기는 형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짜장붕어는 개도 먹지 않는다고...익산여행중 붕어찜을 먹으러 간다는 이야기가 그닥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기본찬은 그저 그랬습니다. 이곳이 전라도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평균이하였습니다.붕어찜 4인분이 나왔습니다. 푸짐하니 좋아보이기는 하지만 너무 맵지는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됩니다.
자박자박하게 미리 끓여져서 나와서 바로 먹어도 됩니다.살짝 맛을 보니 그다지 맵지는 않네요. 좋습니다...
큼직한 붕어 4마리에 (4인분이니까 당연히 4마리를 줘야겠죠 3마리 주면 싸움납니다...ㅋ)
맛이 제대로 든 무우가 가득 들어있네요...
과하지 않게 살짝 감도는 생강향도 좋았습니다.^^사진촬영을 위해서 붕어 한마리를 위로 올려보았습니다. 큼직하니 좋습니다.
일본에 선조를 두고있는 떡붕어로 추정됩니다. 낚시의 달인으로부터 참붕어, 떡붕어, 짜장붕어를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긴 했는데 아직 정확히는 구별하지 못합니다.
외모로 보아도 떡붕어로 추정되고 참붕어를 써서는 단가 맞추기가 불가능하고,
설마 짜장붕어를 쓰지는 않을거라는 생각으로, 떡붕어라는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참붕어라면 붕어찜이 아니라 참붕어찜이라고 했겠죠...^^생물학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붕어해부 시작합니다...^^
살이 실하고 알이 가득하네요...^^
1인당 한마리씩...^^
먹을직스럽나요?
양념의 간도 적당해서 붕어살에 양념을 푹 찍어서 먹으면 정말로 별미입니다...^^
붕어살에서 잡내가 전혀 안나요... 짜장붕어가 아닌것이 분명합니다.붕어찜에 들어있는
가시 바르는 것이 좀 번거롭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원래 가시가 많은 놈인걸...
밥은 지은지가 좀 되었더라구요. 조금 아쉬웠으나 이정도의 아쉬움은 너무나도
훌륭했던 붕어찜에 의해서 충분히 만회가 되고도 남습니다...^^
여행길에 먹은 보양식 붕어찜 한그릇으로 행복감이 배가 되었습니다.누른밥으로 마무리...^^
-
조승자#65
2012.03.18 08:13
황홀한 망진산에서 갑자기 붕어찜이 되더니 누릉지밥으로 끝났습니다.
역시 김선생님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망진산 때문이겠지요.
산, 산, 산, 저는 김창준씨의 망진산같이 아름다운 산은 기억에 없지만
어릴때 돈암동 뒷산을 동네 아이들이랑 동생들과 헤메였던 추억이 있습니다.
돌바위 언덕에 핀 들꽃사이로, 산딸기, 이름 잊은 달콤한 검은 열매 따 먹으며
호랑나비, 흰나비
| No. | Subject | Date | Author | Last Update | Views |
|---|---|---|---|---|---|
| Notice | How to write your comments onto a webpage [2] | 2016.07.06 | 운영자 | 2016.11.20 | 18194 |
| Notice | How to Upload Pictures in webpages | 2016.07.06 | 운영자 | 2018.10.19 | 32351 |
| Notice | How to use Rich Text Editor [3] | 2016.06.28 | 운영자 | 2018.10.19 | 5929 |
| Notice | How to Write a Webpage | 2016.06.28 | 운영자 | 2020.12.23 | 43842 |
| 265 | 구름 [7] | 2012.08.04 | 김창현#70 | 2012.08.04 | 4462 |
| 264 | [re] 낙엽을 태우면서 / 이효석 [7] | 2012.02.21 | 황규정*65 | 2012.02.21 | 4434 |
| 263 | Shall We Dance? - At Last ! [3] | 2012.02.03 | 운영자 | 2012.02.03 | 4397 |
| 262 | 대선을 치르고! [8] | 2012.12.20 | 김이영*66 | 2012.12.20 | 4377 |
| » | 망진산 [10] | 2012.03.16 | 김창현#70 | 2012.03.16 | 4366 |
| 260 | 금강경을 읽으면서 [4] | 2012.06.18 | 김창현#70 | 2012.06.18 | 4327 |
| 259 | [Essay] A Rambling(2) [3] | 2013.01.12 | 이한중*65 | 2013.01.12 | 4301 |
| 258 | [단편] 철새 [6] | 2013.02.14 | 김일홍#Guest | 2013.02.14 | 4281 |
| 257 | 선물 [11] | 2012.01.01 | 노영일*68 | 2012.01.01 | 4239 |
| 256 |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3] | 2012.07.31 | 장원호#guest | 2012.07.31 | 4230 |
| 255 | 수필집 -등받이 [5] | 2011.10.10 | 오세윤*65 | 2011.10.10 | 4214 |
| 254 | [Essay] Rambling(5) [3] | 2013.04.18 | 이한중*65 | 2013.04.18 | 4192 |
| 253 | 착한 바보로 살기 싫어서 - 한국사회의 실정 (?) [3] | 2016.06.21 | 운영자 | 2016.06.23 | 4184 |
| 252 | 고엽(枯葉) [2] | 2012.06.24 | 김창현#70 | 2012.06.24 | 4074 |
| 251 | [오세윤 수필집 - 등받이] 2. 금메달 [4] | 2011.10.12 | 오세윤*65 | 2011.10.12 | 4042 |
| 250 |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15] | 2012.02.07 | 황규정*65 | 2012.02.07 | 4001 |
| 249 | 이효석씨의 글과 그의 약력을 읽으면서 [10] | 2012.02.21 | 운영자 | 2017.05.31 | 3994 |
| 248 | [Memorable Photo] 선친의 옛 발자취를 찾아서 [8] | 2014.08.06 | 정관호*63 | 2024.01.05 | 3973 |
| 247 | [Essay] 나는 심부름 왕 [1] | 2012.09.21 | 석동율#Guest | 2012.09.21 | 3872 |
| 246 | 정이 뭐길래 [4] | 2011.10.08 | 오세윤*65 | 2011.10.08 | 3859 |


















半世紀가 지난 어는 날 찾아가본 고향엔
어디가 어딘지 분간하기도 어렵고,
옛날 살던 집터도 놀이터도 모두 없어지고
고속도로가 돼든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섯든지..
철부지 애들은 이방에서 온 길잃은 노인인가 싶어
어디서 온 분이냐고 물어 본다면,
간단히 대답하기가 무척 어려지는 순간..
동네 강아지 마저 낫선 사람이라고
자꾸 짓어대고 ..
그래서
이제는 옛 고향에 다시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 읍니다..
제고향이 대전 남쪽 유성-가수원 근처
기성면 도안리 엿는데
이제는 동네가 대전시 확장 바람에 이름도 바뀌어졋고,
아담한 옛날 초가 동네는 볼품 없는 도시주변 동네로 전락해 버렷군요.
할머님이 항상 우물물 기러가셧든 "은행샘" 터는 나무만 남아있고
우물 얘기는 벌써 다 전설속으로 사라진 모양.
아래에 누가 그 동네 사정을 이렇게 올려놨군요
http://blog.daum.net/chnam9905/10707182
갑천 물건너 산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이름이
가새바위
그 아래 1956 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산소을 모셧는데,
이장을 몇번 하다보니 다른 묘지를 찾기가 힘들어
유골을 수습해 나무 아래 여기 저기 뿌려 놧다고 합디다.
이런 경우를 요새는 "樹葬" 이라가고 한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