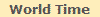






- Total
- General
- Arts
- Book
- Culture
- Economy
- Essay
- Fun/Joke
- History
- Hobbies
- Info
- Life
- Medical
- Movie
- Music
- Nature
- News
- Notice
- Opinion
- Philosophy
- Photo
- Poem
- Politics
- Science
- Sports
- Travel
Essay [강민숙의 연재수필] 홍천댁 9 - 벽절
2011.08.17 18:40
Comment 4
-
이기우*71문리대
2011.08.17 19:16
-
운영자
2011.08.18 04:28
옛날에는 어느집이건 아이들이 둘셋 병으로 죽는게 예사였다는것이
바로 윗글과 전글에 몇번 나타나지요. 필자의 형제를 포함해서...
본인의 어머니도 아이들 4명을 잃는 슬픔을 당했지요.
본인 위로 세명, 밑으로 하나 죽었지요.
내가 거기서 죽지않고 살아 남었다는게 어떠면 기적같게 생각됩니다.
시골에서 애써서 키운 아이를 잃는다는게 특히 어머니에게 얼마나 힘든일일가 생각해봅니다.이글이 잘써졌음은 이렇게 하나 하나, 또박 또박, 읽는 사람의 어린 시절을 연상시켜주는것이겠죠.
평범한 묘사이지만, 이렇게 마음에 꼭 와서 닿는 글을 써야 잘쓰는 글이라고 생각하지요. -
신성려#65
2011.08.18 06:24
홍천댁이 불쌍해서 어떡해!!!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집니다.
-
조승자#65
2011.08.18 09:02
가슴을 쳐도 모자라는 아픔을 흐르는 강물처럼 받아드리는 여인들의 삶을
슬프다거나 아프다는 형용사를 쓰지않고 강물 흐르듯이 나직 나직 들려주는
작가의 참한 이야기 솜씨에 감탄합니다.
이야기가 그치지 않기를 바라도록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필력이
아름다운 서정시의 타래로 역이어가네요.
강물처럼 이어지는 삶의 타래뭉치가 방관하듯 회고하는 소녀로 인하여
엉키지 않고 "찰랑 찰랑 춤추고 노래하며" 오래 오래 흐르는
푸른 강물이 되리라고 희망합니다.

---- 저자(시인) : 심은섭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무언가를
숨겨놓고 나오기만을 기다릴 것만 같은
언제라도
응석 받이로 어서오라 품에 꼭껴안아 줄 것만 같은
내 고향 벽절
그믐밤 목탁소리에
십리를 밝히고
스산한 풍경소리에
낙엽마저 조아리고
흐르는 듯 마는 듯
강물 벗 삼아
천년 버팀목 은행나무 한 그루
강물에 뛰어들듯 앞자락 나룻터는 ?
풍류를 수놓던 석양에 조각배는?
사라진 발자욱들이 어서오라 반기는곳
그 보다 허전한것은, 가슴에
구겨진 얼굴 하나, 숨어 눈 흘키는
오! 가고파라 내고향 신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