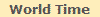






- Total
- General
- Arts
- Book
- Culture
- Economy
- Essay
- Fun/Joke
- History
- Hobbies
- Info
- Life
- Medical
- Movie
- Music
- Nature
- News
- Notice
- Opinion
- Philosophy
- Photo
- Poem
- Politics
- Science
- Sports
- Travel
Essay 思婦曲 - SNU Medical 동문의 모든 아내들에게
2011.07.20 23:50
Comment 10
-
이한중*65
2011.07.21 01:57
-
황규정*65
2011.07.21 02:49
딸애가 비교적 늦은나이에 시집가서 임신했다는 기쁜소식을 듣고
아내는 坐不安席 이것저것 챙겨주기 바뿐데 아내는 딸보다 훨씬
어린나이에 일가친척 하나없는 만리타향에와서 바뿌다는 핑게로
별도움을 주지 못하는 남편에 아랑곳 없이 두애를 낳아길른것을
보면 눈시울이 적셔지며 안스럽기 짝이없다.숫도많던 칠흙같던 아내의 머리카락이 이제 듬성듬성해지며 잿빛으로
변하였으니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며 노년에 비교적 건강하게 같이 의지하며
늙어가는 우리 모두들은 자축해야 할것이며 행복함을 느껴야 할것이다.형 말씀이 맞습니다. 아내들은 우리들의 등받이 들이며 우리 가정들의
기둥들입니다. 좋은글에 감사드립니다. 규정 -
운영자
2011.07.21 06:25
제목을 바꾸는게 어떨가요? 동기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SNU Medical 동문들의 모든 아내들에게"이차적 해석으로, 부부라는것은 어쩌면 "비빔국수" 가 아닌가합니다.
인생의 달고 쓴 모든것을 섞어서, 꼬이고 석인채 한덩어리가 된것이 아닌지?
한쪽이 다른쪽의 등받이라는 사실을 깨닳었을때, 그것이 노년의 조용히 여문(익은) 사랑이라는것이겠죠. -
오세윤*65
2011.07.21 08:54
거 좋네요. SNU Medical 동문들의 모든 아내들에게로 고쳐주세요.
이곳이든 그곳이든, 70나이를 넘어 해로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니지요. 우리네 남정네들에게 아내란 모두가 고마운 존재이지요.
곧 나올 책의 제목도 이것으로 했어요. 아내와의 이야기도 두어 개 더하고요.
팔불출이 됐죠. 그런들 어떻겠습니까. -
김창현#70
2011.07.21 11:29
<“이럴게 아니라 우리 비빔국수집을 하나 차리면 어떨까. 간판도 ‘고향비빔국수’라고 달고 말야.”>
점입가경입니다. -
계기식*72
2011.07.21 19:45
제 부모님이 황해도분들입니다. 안악과 장연입니다. 뚝뚝하신 편이고.... 그래서 저도 좀 그렇습니다.^^
부친께서는 92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황해도 사투리를 쓰셨는데, 나중에는 강원도 영서지방 말과 약간 섞였지만,
황해도 말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황해도 사투리를 몇개 압니다. 말이 전반적으로 좀 느린 편이고...,
상게도 (아직도...), 가가이 ? (갈래 ? wanna go ?), 먹가이 또는 먹게이? (먹겠니 ? ),
거시기 (전라도만 쓰는 말이 아니더라구요) -
오세윤*65
2011.07.21 23:22
그러셨군요.
계씨 집안 하면 우선 평안도를 생각하고 초기 목사님 집안이란 게
연상되지요. 11기의 계희숙선생님과는 어찌 되시는지요?
가르쳐 주실라니꺄? -
계기식*72
2011.07.22 14:13
오선배님,
계씨가 황해도 수안 계씨인데, 평북 선천파가 제일 많아서 평안도 출신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는 황해도 수안파입니다. 계희숙 선생님과는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한 할아버지의
자손이겠지요... 제가 학생 때, 그 분이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같은 종씨이니까요..
"주실라니꺄?"도 황해도 사투리지만, 저희 부모님은 지역이 좀 달라서인지 안쓰시더라구요... -
신성려#65
2011.07.23 14:07
다시 오박사님글을 볼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임진강, 연천은 저의 본적이고
선산이 있는 곳입니다.
비빔밥 먹으러 한번 가보고 싶네요.등받이로 믿어주는
남편을 곁에둔 아내들은
모두 행복한 여인들입니다.이웃집 오빠가 들려 주는것 같은
다정한 글.
그러면서 나를 되돌아 보게 하는글.
감사합니다. -
오세윤*65
2011.07.24 01:58
그러셨군요.
연천은 지도상으로야 경기도지만 위도와 정서상으로는 황해도에 가깝지요.
비빔국수를 먹으러 가던 가 군남면으로 견지를 가 보면
뚝뚝하고 투미하고 부침성이 없으면서도 남 속이거나
하지 않는 순박한 인심이 꼭 고향같답니다.
할배가 경상도 사람이긴 하지만 사리에 밝고 언행이 깨끗해
크게 어렵지는 않으셨으라 생각됩니다만 -. ㅎ . 정서는 조금 다르겠지요.
지금도 손주하고만 노나요?
일전 다녀 간 채도경 동문을 통해 소식 한 자락은 들었더랬습니다.
두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 No. | Subject | Date | Author | Last Update | Views |
|---|---|---|---|---|---|
| Notice | How to write your comments onto a webpage [2] | 2016.07.06 | 운영자 | 2016.11.20 | 18193 |
| Notice | How to Upload Pictures in webpages | 2016.07.06 | 운영자 | 2018.10.19 | 32343 |
| Notice | How to use Rich Text Editor [3] | 2016.06.28 | 운영자 | 2018.10.19 | 5919 |
| Notice | How to Write a Webpage | 2016.06.28 | 운영자 | 2020.12.23 | 43838 |
| 1802 | 손주들 보러 [8] | 2011.07.23 | 이한중*65 | 2011.07.23 | 6770 |
| 1801 | 연꽃들을 모아... [10] | 2011.07.22 | 신성려#65 | 2011.07.22 | 5157 |
| 1800 | 역사속의 오늘 - Ernest Hemingway [13] | 2011.07.22 | Chomee#65 | 2011.07.22 | 6756 |
| 1799 | 외손녀 데리고 산보/봉녕사에서 [4] | 2011.07.21 | 김창현#70 | 2011.07.21 | 5887 |
| 1798 | 알라스카 크루즈 4 [3] | 2011.07.21 | 계기식*72 | 2011.07.21 | 5405 |
| 1797 | 거미줄에 햇살 한 자락 [7] | 2011.07.21 | 이기우*71문리대 | 2011.07.21 | 5678 |
| 1796 | 북한의 훙수피해 조작 관련 웃기는 만평 [2] | 2011.07.21 | 계기식*72 | 2011.07.21 | 6785 |
| » | 思婦曲 - SNU Medical 동문의 모든 아내들에게 [10] | 2011.07.20 | 오세윤*65 | 2011.07.20 | 5306 |
| 1794 | 김연아의 예쁜 모습들 [3] | 2011.07.20 | 황규정*65 | 2011.07.20 | 6691 |
| 1793 | National Geographic 풍경 사진 모음 [1] | 2011.07.20 | Yonnie#65 | 2011.07.20 | 8940 |
| 1792 | 알라스카 크루즈 3 [3] | 2011.07.19 | 계기식*72 | 2011.07.19 | 6116 |
| 1791 | Prayers by Thomas Merton [4] | 2011.07.19 | 이한중*65 | 2011.07.19 | 3532 |
| 1790 | [Essay] 판소리 춘향가 [3] | 2011.07.19 | 김창현#70 | 2011.07.19 | 11935 |
| 1789 | 알라스카 크루즈2 [3] | 2011.07.18 | 계기식*72 | 2011.07.18 | 5362 |
| 1788 | [Medical Column] 6. 조기수축 | 2011.07.18 | 이종구*57 | 2011.07.18 | 5846 |
| 1787 | [동창회 뉴스] 2012 Convention & Cruise Information [1] | 2011.07.18 | 운영자 | 2011.07.18 | 5661 |
| 1786 | [Essay] 남방셔츠 [8] | 2011.07.18 | 오세윤*65 | 2011.07.18 | 5181 |
| 1785 | 민박사님의 연못에... [5] | 2011.07.17 | 이기우*71문리대 | 2011.07.17 | 5644 |
| 1784 | Other Waterlilies at Longwood Gardens [4] | 2011.07.17 | 이기우*71문리대 | 2011.07.17 | 7924 |
| 1783 | Victoria Waterlily at Longwood Gardens [6] | 2011.07.17 | 이기우*71문리대 | 2011.07.17 | 7433 |

푸근하고, 구수하고, 가슴을 울리는,
깊은 계곡을 연상시키는 두분간의 진실한 사랑,
매일같이 하루하루 평범한 삶을 같이 살아오고있는,
형과 같이 함께 늙어가고있는 동문부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되는 이야기입니다.
한줄 한줄,
비빔국수의 진미를 감상하듯 즐기며 읽었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