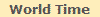






- Total
- General
- Arts
- Book
- Culture
- Economy
- Essay
- Fun/Joke
- History
- Hobbies
- Info
- Life
- Medical
- Movie
- Music
- Nature
- News
- Notice
- Opinion
- Philosophy
- Photo
- Poem
- Politics
- Science
- Sports
- Travel
Essay 마지막 성묘, 2013년
2023.10.03 20:59
“아주머니, 길 좀 묻겠읍니다.”
“예, 어딜 찾으시는데유?”
“우리가 성묘가는 길인데요, 오랫만에 오니까 길이 너무 달라 져서
통 길을 찾을 수가 없읍니다. 저 고속도로가 나기전에 강건너편에서
배타고 건너 오면 강따라 가는 길이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찾아 갈 수 있을가요?”
“글쎄요, 그 큰 길이 난지는 한참되었걸랑요. 어찌 갈쳐 드려야 할랑가?
주소가 어떻게 되지유?”
“주소는 모르고요, 늘 배 타고 강을 건느면 바로 보이는데였어요.”
“아이구, 아자씨, 주소없이 어찌 뭘 찾으실랑가?”
맞는 말이다. 옛날 서울 역 앞에서 촌 할아버지, 김 서방 찾아 달라 했다고
농거리되어 웃었었는데, 미국서 오랫만에 찾아 온 손자가 꼭 그 격이 되었다.
난감하다. 오기전에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삼촌께서 어림잡아 조카에게 그려 주신
약도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보니 어느새 강을 건너 와 있고,
나룻배에서 내리는 강변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눈을 부비고 찾아도
비스름 한 흔적도 없다.
손자는 애꿎은 음식점 아주머니를 잡고 매달린다.
“아주머니, 혹시 조 OO라는 사람 아시거나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댁을 찾아가면 알 수 있거던요.”
“아이구, 선상님, 모르겠는데유, 쯧쯧.”
남 바쁜시간에 주소도 없이 집을 어찌 찾겠느냐고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혀를차며 돌아 선다.
그때 마침 이른 점심을 들고 있던 신사복차림의 젊은청년이
국밥을 한가뜩 입에 문채 손 짓하며 설명한다.
“저 큰길로 한참 가시다가 오른 쪽으로 길이 갈라 지는데요,
그리로 쭈욱 가시면 강을 따라 가는 길이 나오걸랑요. 그 길로 내려가셔서
굴다리 밑을 지나서 쬐끔 가시면 왼편쪽으로 마을 건강진단소 간판이 있는
이층집이 보일겁니다.
그쯤 근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근처에 가시면 찾을 수 있으실겁니다.”
알듯싶게 들리는 설명이 반가워서 땀흘리며 식사하는 그 손님앞으로
바짝다가 가서 행여 놓칠새라 매달린다.
“실례합시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읍니까? 통 길이 낯설어서요.”
“그러시면, 우리가 밥먹고 그쪽으로 가니까 우릴 따라 오세요.
길 갈라서는 곳까지 따라오시다가 우리는 곧장 갈테니까 아랫길로 가십시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나는 구멍이 있다는게 이런 때 쓰는 말인가보다.
화장실을 들릴 심산이었으나 그 젊은이가 후닥닥 일어서는 바람에
그분들을 놓칠새라 우리 셋(남편과 나, 그리고 차를 갖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남편의 절친한 친구 이상운대령)은 다급히 차에 올라 젊은이 차 뒤를 바짝 쫒는다.
한 오분쯤 가니 길이 갈라지는 길몫이 나오고 젊은이는 손짓으로
아래로 난 길을 가르키곤 속력을 내어 가버린다.
아닌게 아니라 길을 갈라서자 마자 곧 강이 보였다.
“아, 여기다. 이제 알 것 같은데…” 남편은 안도의 숨을 쉰다.
금강은 여전히 넓고 맑았다. 강 건너 병풍처럼 둘러 싼 산자락엔
푸른 숲이 무성하고 강물은 넘칠 듯 강변가로 넘실거리는데
푸른하늘의 흰구름 뭉치들이 짙고 또 엷게 검푸른 빛갈의 그림자되어
강물위에 내려앉아 춤춘다.
설흔 한해 전, 1982년 유월이였다.
십삼년만에 미국에서 처음 다니러 왔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 어른들을 따라 성묘를 왔었다.
그때는 강건너에서 "어혀, 어혀!" 소리질러 강건너 사공을 불러서
나룻배를 타고 건느며 마을소식을 들었었다.
아무게네 딸이 시집을 갔고, 아무게네 아이들은 공주에 나가 학교에 다니고,
집집마다 전기가 들어 온다는 등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룻배 놀이가
신기로워서 아이들은 강폭이 더 넓지않은게 서운해 했다.
서울에서 마련해 온 도시락을 대청마루에 펴니 산직이댁은 몸 둘바 몰라하며
우물에서 갖 따온 고추와 오이를 씻어서 막장종지를 곁드려 가지고 온다.
마당 한켠에 있는 펌프에서 물을 길어 손을 씻으니 아이들은 크나 큰
요술이라도 부리는가 싶어하며 신기해 했다.
우리를 데리고 가셨던 시고모부님과 세분 고모님들은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나신지 오래다.
강자락을 옆으로 남겨 두고 산으로 오르는 손자의 걸음은 바쁘다.
그사이 무성해진 소나무 숲 사잇길로 키만큼 자란 엉겅키를 손으로 헤치며 오른다.
아침녘에 나린 초여름 가랑비에 가뜩이나 가파른 산길이 미끄럽다.
두리번 거리며 길몫을 가늠하던 손자는 믿기우지 않는다는 얼굴을 한다.
두세번 산길을 오르내리며 미끄러지며 헤매였으나 황당하게도
남편 머리 속에 있는 봉분이 나타나지 않았다.
무작정 산길을 헤맬 수는 없었다. 할 수 없이 오던 길을 돌아 하산한다.
마을로 내려온 일행을 이끌고 기웃기웃 대문에 붙은 명패를 들여다 보던
손자가 만면에 미소를 띠우며 말한다.
“아직 이분이 같은 집에서 살고 계시군. 이 봐, 명패에 써 있지, 조 OO씨라고.
우리 일가 되시는 분인데 선산을 맡아 돌보시는 분이거든.”
활짝 열려 있는 대문안을 기웃거리며 주인을 찾았으나 인적이 없다.
지붕은 옛 개와를 벗어버리고 알미늄을 쓰고 있고 옛 펌프는 여전히
마당 한 켠에 서 있다.
빈집에 들어서지 못하고 돌아서 나와 마을을 둘러보니 두어집 건너
앞마당에 마침 한 노인이 담배를 태우고 계신다.
“여보세요, 실례합니다. 말씀 좀 여쭈워 보겠습니다. 여기 조 OO씨를 찾는데
지금 어디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어디 마실나간다고 하던데유.”
“아, 그렀읍니까?”
낭패한 표정을 숨길 수 없다.
“혹시 언제쯤 오시는지 아십니까?”
“아무 말 못들었는디… 우째 찾으시는지?”
“예, 인사가 늦었습니다. 조성구라고 합니다.
조부모님 성묘를 하러 왔는데요, 그동안 영 주변이 바뀌어서
산소를 찾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조OO씨의 안내를 받고 싶어서 찾아 왔습니다.”
“아, 그러시담 조진사댁 손자시구먼요.
그렇담 내가 대강 길을 잡아 드리지요.”
우리는 노인을 따라 다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앵두가 익고 있는 담벼락을 지나니 밤나무가 늘어서서 알밤을
품기 시작한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어 누구하고인지 담소하며 걷는다.
산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데 강변에 우뚝 솟은 벼랑위에 알록 달록한
지붕을 이고 앉은 양옥집들이 눈에 들어 온다.
손자가 묻는다.
“아저씨, 저 벼랑에 양옥들은 언제 저렇게 올라갔습니까?”
“아, 저 펜숀이요?”
“예? 펜숀이요? 그게 뭡니까?”
“아, 그 펜숀 있잖아유, 서울 양반들이 주말에 내려와서 쉬었다 가는
펜숀이요, 펜숀!”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것도 모르느냐는 눈치다.
다니러 온 손자는 입문이 막힌다.
옛 증조할아버지가 친구분들과 앉아서 시를 읊고 화담을 즐기셨다던
정자는 간데 없고 변함없이 흐르는 금강을 내려다 보는 절벽위에
서울 양반들이 내려와서 쉬고 간다는 펜숀이 늘어서 있었다.
묵묵히 산허리를 돌아 오르니 산마루가 훤히 트인 산벼랑에 봉분들이
나란히 솟아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분과 작은 할아버지, 할머니 두분, 이렇게 나란히
아래 위로 푸른 장발을 하고 누워 계셨다.
봉분 바로 아래에는 어느집 뒷뜰이 분꽃밭을 담으로 선을 긋고
봉분을 올려다 보고 있었다.
훤히 트인 언덕아래로 강물이 흐르고 뒤로는 나무들이 병풍되어
바람막이가 되어 주는 풍수지리에 명당인 묘소일터인데 어느새
인적이 참지 못하고 봉분앞으로 절하듯이 닥아와 있었다.
착잡한 마음을 누르고 하산하는 길모서리에 함지박에 빨갛게 익은
앵두를 이고 가는 아주머니가 조진사댁 도련님이시냐고 인사를 한다.
오랫만에 찾아 온 손자의 향수에 찬 얼굴에 어색한 미소가 머뭇거린다.
손자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삼촌이 들려주시던 흥미 진진한 추리소설 이야기에
매료되어 푸른물이 넘실거리는 금강이 나올때 까지 타박 타박 흙길 신작로를
다리아픈것도 잊고 걸어 갔던 어린시절의 성묘길이 파노라마처럼 눈에 서언한데
지금은 서울양반들이 주말이면 내려와서 쉬어 간다는 알룩 달룩한 펜숀들이
즐비하겠지 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그해 여름에 다녀온 후 다시는 성묘를 갈 수 없게 된
칠십넘은 노인 손자의 변이다.
2013년 시월이였다.
Comment 8
-
성묘 성공하셨군요. 부럽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삼대가 큰 마음먹고 김해공항에서 택시 대절하여 진주시 일반성면 가선리 선산에 모셨던 아버님 산소에 성묘갔다가 믿었던 일가 조카벌되는 XX씨 주소에 갔더니, 그 집은 있는데, abandoned house이고 아무도 살지 않고
근방 사람에게 물어보니 한 2, 3년전에 사망하고 아들 가족은 이사를 갔다고만 하여서 내가 옛 기억을 더듬어 산으로 올라가는 시골 발자국길로 오르려니 그곳이 모두 우리 가문의 산소를 모셨었는데, 큰 밭이 되고 철망으로 막았어요. 긴얘기를 잛게 하자면 (To make a long story short) 20대 손자를 시켜서 길없은 숲속산에서 찾으라고 하여서 손자가 30분내지 한시간 찾아가 실패하였고, 길없는 험한 산속에서 내가 오르려니까 아들이 만류하여셔 결국 포기하고 왔습니다. 나의 경우에는 마지막 성묘가 2010년 여름이었지요. 나는 완전히 실패한 성묘 경험담이라도 다음에 올려야겠군요. 기대하세요, Dr. 조.
-
정선생님, 비슷한 경험을 하셨군요.
오래동안 멀리 떨어져 있으니 어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현대식 사고방식에 따라 관혼상제의 문화가 바껴가니까
흐르는 물결따라 흘러가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남의 손을 빌려 조상님 영혼을 모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듭니다.
가끔 더 늦기전에 이런 우리 세대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
조성구 가족은 운이 좋았군요.
본인도 할아버지 묘 찾아갔다가 못 찾고 그자리에서 먼산에 절만하고 돌아왔었지요.
이 얘기를 딴 한국친구에게 했더니, "너 참 잘했다. 원래 그러는거야" 하더군요.
자기는 잊어먹고 그것도 못했다고 후회하더군요.
얼마후에 증손자로 부터 묘를 찾었다눈 연락아 왔지요.
할머니 묘를 찾아갔는데 묘직이가 자기는 어딘지 기억 못하겠다 해서 다시 먼산에
절만하고 돌아왔읍니다. Dr. 정,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요.
Dr. 정, 다음번에도 못 찾으시면 잊지 마시고 그 방향에 절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지금쯤은 우리 선조님들도 우리가 못찾는줄 잘 아시고 있으시라 기대합니다.
조상님들의 묘를 찾아가는 재미교포들의 애튿한 향수의 심정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Thanks Mrs. Cho. 우리같은 "실향민"에게는, It is an 애절한 good story.
우리가 할아버님의 묘를 못 찾을때, "아, 나는 정말 이제 고향을 잃었구나!"
어딘가 한없이 쓸쓸하고 공허한 본인 자신의 존재를 느낌니다. 좋은(?) 경험이지요.
-
조상님을 마음속으로 기억하는 것이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형식적인 절차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냉정하게 생각하고 지냅니다.
우리가 간 후에 아이들에게 그런 유교사상에서 존속된 관혼상제 문화에매이지 않게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고향하늘을 향해서 절을 하는것도 같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기일에는 영정앞에 촛불을 켜고 고인이 좋아하시던 꽃을 놓고 절을 했는데
팔십노인 아들, 며느리가 "아이구 다리야, 아이구, 허리야" 하며 희극을 연출합니다.
It may be the time to accept the change.
-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미국에 사는 우리들 뿐 아니라 한국에 사는 친구들도 비슷한 말들을 하더군요.
시대의 흐름이요 변화니 그저 그러커니 하고 사는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조선배님 글을 보니 반갑습니다.
-
한국의 관혼상제 문화도 급속히 바뀌고 있으니
이곳에 사는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지요.
지난 7월 28일에 Aspen Music Festival에서 임윤찬군의 열연을 감상하면서
노선생님 손자 생각을 했습니다.소식 나누어 주세요.
-
이 글을 읽은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만클 동문들의 성묘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증거지요.
그런데 나의 처음 글에 성묘실패담을 쓰겠다고 하였는데, 그걸 취소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귀국하여서 그동안에 알게 된 산소주소와 마을에서 산소로 올라가는 약도도 갖게 되었고, 또 새 관리인을 찾게 되어서,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년 초여름에 재차 성묘를 시도하려고 하며 그 성공담을 올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연말 연시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의 연휴 추석휴가를 즐기는 한국의 형제, 친구들의 풍성한 모습을 보며
십년전에 다녀온 우리들의 낯설었던 성묘가 생각나서 그때 적어 두었던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