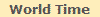






- Total
- General
- Arts
- Book
- Culture
- Economy
- Essay
- Fun/Joke
- History
- Hobbies
- Info
- Life
- Medical
- Movie
- Music
- Nature
- News
- Notice
- Opinion
- Philosophy
- Photo
- Poem
- Politics
- Science
- Sports
- Travel
General 강둑 길, An essay by 오 세 윤
2005.08.09 16:48
|
강둑 길 오 세 윤 무릉리로 그녀를 찾았다. 전원생활이라고는 하지만 남편의 병간호와 텃밭을 혼자 가꾸는 그녀를 생각하면 한유함보다는 안쓰러움이 먼저였다. 법흥사 가는 길목, 삼거리의 ‘콩깍지’식당 주차장에 그녀는 벌써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삼베 적삼에 몸뻬 바지, 갈데없는 촌 아낙이었다. 그냥 찾아들어가도 되련만 그녀는 매번 이곳까지 나와 오는 손님을 맞는다. 휴가 첫날, 아내는 하루 전에 먼저 딸네 식구들과 동해바다로 떠났다. 미룬 일을 마치고 뒤따라 가마하고 가족을 보내고 난 날 밤, 청승맞게도 껌껌한 뒷산 숲에서는 밤 뻐꾸기가 스산스럽게 울었다. 새끼에게 무슨 변고라도 일어난 걸까? 일찍 잠자리에 들기에는 무언가 미진했다. 책장을 뒤적이다 하릴없이 묵은 사진첩을 빼내 펼쳤다. 중간 뒤쪽쯤, 갓 스무 살의 그녀가 물가 바위에 몸을 기댄 채 햇살을 눈부셔하며 고개를 살짝 숙인 모습으로 소담스럽게 웃고 있었다. 정면이 아닌, 비스듬히 찍힌 사진이었다. 자연스러움을 가장하고 찍은 나의 흑백스냅사진이었다. 대학 2학년, 겨울방학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새 학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친구 진섭은 학보로 군에 입대하도록 결정이 나 있었다. 고교 때, 아홉 명으로 이루어진 모임이 각기 다른 단과대학으로 흩어져 진학하는 바람에 일년에 몇 차례밖에는 모이지를 못했다. 하나 둘씩 군에 가게 되면 만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며 누군가가 서천으로 1박2일 여행을 다녀오자고 했다. 바닷가 동백정에는 꽃이 한창일거라고도 했다. 이의 없이 그러기로 정한 자리에서 진섭이 엉뚱한 제안을 했다. “꼭 데리고가야할 사람이 있는데 안 될까?” 모두들 그가 한 말의 진의를 몰라 궁금해 하는 중에 그는 한술 더 떠서 더 깜짝 놀랄 말을 서슴없이 내 뱉는다. “여자야, 너희들도 알지 몰라. 고등학교 1년 후배거든.” “누구야, 이름이 뭔데?” 동석이가 이름부터 먼저 물었다. “돼? 안돼?” 거기엔 대답을 않고 진섭이 초조한 듯 재우쳐 물었다. 어떻게 대답해야할지 몰라 모두들 멀뚱하게 서로 얼굴들만 쳐다봤다. 누군가가 먼저 무슨 말이라도 꺼내주기를 기다렸다. 평소 그의 성격으로 보나 지금의 태도로 보아 거절하게 되면 진섭은 이번 여행을 포기할게 뻔했다. 좌장격인 주호가 모두를 대신해서 어렵게 허락을 했다. 하지만 함께 한방을 쓰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못을 박 듯 말했다. 그거야 말할 건덕 지도 없다고, 누구를 뭘 로 보느냐고 진섭은 그제야 껄껄 웃으며 벼슬 돋은 장닭처럼 퍼덕퍼덕 좋아했다. 떠나는 날 아침, 서울역 대합실에 나온 그녀를 보자 모두들 의외라는 듯 놀라기는 했지만 그래도 너나없이 반갑게 인사들을 했다. 학교 교정에서 간간이 마주쳤던 얼굴이어서 낯이 아주 설지는 않았던 때문이었다. 다만 나 하나만이 속으로 아연 실심했을 뿐이었다. 그녀도 진섭을 통해 면면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미 알고는 있었던 듯 스스럼없이 모두에게 새롭게 초면 인사를 했다. 나에게도 한가지로 초면인척 태연했다. 그녀의 깜찍함처럼 내 속은 그렇게 태연하지 못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의 그때의 정경은 그날 밤에 이어 몇날 며칠을 두고 밤이고 낮이고 구별도 없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예리하게 가슴을 후벼 도려내면서 끈질기게 나를 괴롭혔다. 몇 달이 지나서도 그러한 아픔은 전혀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 오래도록 쓰리게 되새김질을 하는 불면의 기억이 됐다. 하지만 친구와 다툰다는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기득권은 존중되어야 했다. 동백정에서 하루를 묵고 상행기차를 기다리는 서천역의 프랫홈에서, 그녀가 단 한번 지나가는 말로 나에게 사적인 일을 물었다. “의과대학은 예과부터도 벌써 공부가 힘이 드나보죠?” 그 당시의 나는 전혀 그 질문의 진의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대수롭지 않은 인사치례의 질문으로만 받았다. 하지만 아주 오랜 뒷날에 가서야 그건 어쩌면 자기가 남의 여자가 되기 전에 왜 좀더 적극적으로 대쉬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도 시간이 없었느냐는 나무람은 아니었을까하는 고문관(생각이 둔하고 행동이 굼뜬 사람)다운 생각이 들기는 했다. 하긴 그러한 추측도 혼자만의 것일지도 모르기는 했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자 한 주일에 한번 특활시간이 있었다. 중학교 때부터 하고 싶었던 터라 주저 없이 정구반에 들어갔다. 2학년 첫 학기가 시작되면서 신입생 몇 사람이 새롭게 반에 들어왔다. 그 중에 그녀가 있었다. 첫눈에도 세련된 미모였다. 깔끔하고 맑았다. 갸름한 얼굴에 눈에 띌 듯 말 듯 가벼운 곱슬머리, 맑고 영리해 보이는, 참하게 가라앉은 눈 표정. 어쩌다 살짝 웃을 때 보이는 하얗고 가지런한 이, 별로 말은 없었다. 남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았다. 쉬는 시간이면 책을 보거나 뜨개질을 했다. 남학생 누구와도 전혀 눈을 마주치는 법이 없었다. 얄밉도록 조신했다. 그렇다고 차가운 인상도 아니었다. 햇살 밝은 6월 이른 아침, 토란 너른 잎새위에 구르는 이슬방울 같다고나 할까, 그냥 그대로 청초하고 맑았다. 가볍게 접근하기에 그녀는 지나치도록 고요했다. 늦가을의 어느 토요일, 서울역을 가느라 탄 전차에 우연찮게도 그녀가 맞은편 자리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도서관에 있다 늦게 귀가하는 모양새였다.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분명 나를 보았을 터임에도 그녀는 전혀 알은체를 하지 않았다. 서울역을 그대로 지나쳤다. 갈월동에서 그녀가 내렸다. 따라 내렸다. 후암동으로 가는 골목길로 또박또박 걸어들었다. 몇 발자국 간격을 두고 따라가면서 헛기침을 해댔지만 그녀는 한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어느 조촐한 한옥의 대문 앞에 멈춘 그녀가 몸을 돌려 정면으로 나를 마주해 섰다. 서늘한 표정으로 맵싸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지요? 선배님.” 기부터 먼저 꺾였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명치끝이 꽉 뭉쳤다. “쓸데없는 짓이어요. 우리들은 모두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일 뿐이어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바로 돌아서 초인종을 눌렀다. 머쓱하게 돌아서는 수밖에 어째볼 틈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학생이 아니었다. 성년이고 여인이었다. 학년말이 되자 갑자기 문과에서 이과로 옮기느라 공부에 정신이 없었다. 매 주말마다 보는 모의시험과 성적관리로 눈코 뜰 새도 없었다. 3학년은 특활도 없었다. 짝사랑은 밤샘공부 속으로 까맣게 묻혀버렸다. 의예과에 진학해서도 공부는 지독하게 계속되었다. 이틀이 멀다하고 시험을 치렀다. 우리는 예과를 고사(高四)라고 했다. 조금만 꾀를 부리면 여지없이 재시험에 걸렸다. 그러는 사이 그녀는 진섭이 다니는 사범대학에 진학을 했고 어느 결에 연인사이로 발전했다. 먼저 졸업하여 교직에 나간 그녀 다음으로 복학하여 졸업한 진섭이 보직발령을 받자 바로 둘은 혼례를 올렸다. 식장안의 샹데리아 불빛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불송곳이 되어 나의가슴을 찔러대고 바작바작 이성을 태웠다. 어떻게 자제하고 서 있었는지 나 자신도 모른다. 무작스레 솟구쳐 오르는 회한을 어떻게 눌러놓았는지, 어떻게 덤덤하게 웃으며 박수를 쳐댈 수 있었는지 정녕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어쨌거나 축하해야만 할 입장이었다.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의 부인이 된 게 아닌가. 조금치라도 누구에게든 속내를 보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의과대학은 타 학과와 달리 지루하게 과정이 길었다. 의대생이 되면서 바로 대부분은 동년배의 여성들과는 사회적 격차가 적지 않음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해가 갈수록 금세 결혼 적령기에 도달하는 그네들에게 우리들은 무능력한 미성년자일수밖에는 없었다. 그러한 자각이 애초부터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열을 올리지 못하고 포기하게 된 이유인지도 몰랐다. 다만 젊음만이 혼자 연정을 주체 못하고 바보처럼 힘들어했다. 부부는 야속하게도 내가 사는 휘경동에다 신접살림을 차렸다. 인사로라도 그네들의 신혼집을 방문해야만 했다. 일요일 하루를 택해 몇이서 함께 그네들 집을 찾았다. 그녀의 성품대로 살림은 간결하고 깔끔했다. 거실 한쪽에 핀 백철쭉 화분 하나까지도 참으로 참기 힘들도록 탐나는 품격이었다. 그 뒤로 몇 해 동안, 가능한대로 그네들의 집은 방문을 피했다. 다행히도 군복무와 전공의과정으로 쉽게 시간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좋은 변명거리가 됐다. 10년 뒤,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잠시 종합병원에 근무하다 사임하고 나와 휘경동에 소아과를 개원하자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집 아이들의 주치의가 됐다. 왕래도 터야했다. 어느 핸가 아이들과 함께 그녀가 몹시 아팠다. 그녀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면서 나의 가슴은 예나 진배없이 전혀 평온치를 못했다. 진섭이 도의 모 부처 담당관이 되자 그녀는 그간 봉직해 오던 W시의 여고 가정과 교사직을 사퇴하고 주천강변으로 새로 집을 옮겨 전원생활을 시작했다. 아이들 둘 모두 대학을 마치고 제각기 독립하여 부담이 없었다. 집 옆에는 따로 500여 평의 밭을 장만해 쪽을 키웠다. 모시와 면, 인견에 쪽물을 들였다. 손수 한복을 지어입고 소품을 만들어 두 차례 전시회도 가졌다. 호사다마라고나 할까, 나이 60도 못되어 진섭이 병을 얻었다. 골수암이었다. 서울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도 진섭과 그녀는 전혀 삶의 자세를 흐트러트리지 않았다. 숭고할 정도로 꿋꿋했고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평온했다. 머리카락은 모두 빠지고 먹는 것도 힘들어했다.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바로 주방으로 들어갔다. 진섭은 전혀 주눅 들지 않은 평시대로의 웃음으로 반갑게 나를 맞았다. 병세를 묻고 서울소식을 전했다. 하기야 전화선을 타고 친구들의 소식이야 나보다도 한결 소상하게 알고 있을 터였지만 벗이란 얼굴을 마주하여 말을 나누는 게 아무래도 더 정겨운 법이 아닌가. 점심상을 물린 잠시 뒤, 그녀가 예반에 차를 바쳐 들고 거실로 나왔다. 어느새 갈아입었을까, 쪽빛 모시적삼에 풍덩한 쪽 치마. 얼마나 정성들여 물을 들였으면 올 하나마다 모시는 올올히 살아 하늘을 숨쉬고 있었다. 언제 또 기름은 발랐을까, 쪽진 머리에는 윤기가 자르르 그려낸 듯 흘렀다. 아 아, 여인의 변신이라니! 고요히 움직이는 탯거리가 깊은 골 홀로 핀 도라지 향처럼 은근하고 아정했다. 차를 마시며 진섭이 그녀에게 일렀다. “여보, 해가 조금 내려서면 오선생에게 새로 알려진 견지낚시터를 알려드리구려. 아니 아예 모셔다 드리도록 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나에게로 다시 고개를 돌리며 진섭이 말을 이었다. “어젯밤 자네가 온다는 연락을 받고는 아침 일찍 이 사람이 영월읍내에 나가 일부러 미끼를 준비했다네.” 나는 그저 웃기만 했다. 그들 내외는 내가 견지를 무척이나 즐긴다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고맙다는 말만으로는 그들의 배려에 오히려 결례가 될 듯싶어 차라리 마음으로만 고마움을 받았다. 3시쯤이 되어 그녀가 나를 뒤따르게 한 뒤 견지 터를 향해 집을 나섰다. 강둑길로 올라섰다. 부채로 볕을 가리고 그녀가 앞을 서서 걸었다. 하늘빛이 곱다 기로 그녀 쪽빛 모시적삼보다 더할까, 두루미의 걸음새가 우아하다한들 풀잎을 스란스란 스쳐 걷는 그녀 쪽 치마 고운 자태를 차마 따를까. 여인의 맵시걸음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인 작금, 그녀의 걸음새는 살아 숨쉬는 소중한 ‘희귀 문화재’일게 확실했다. “쪽빛이 곱군요.” 뒤를 따르며 감탄을 했다. “곱게 보이려구요.”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온 때문인가, 부끄럼 없이 그녀가 웃으며 답했다. 내 가슴도 그녀를 따라 바람으로 트였다. “누구에게 그리 곱게 보이시려고?” “두 분 다요.” 오랜만에 스스럼없이 웃었다.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 속에 앞산이 푸르게 들어와 앉았다. 앞서 걷던 그녀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서 석양을 빛내며 흐르는 강물을 본다. 그녀 곁에 서서 나도 그녀를 따라 강을 내려다본다.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돌려 서로를 바라본다. 석양을 마주한 그녀의 눈동자가 붉게 타고 있었다. 해를 등진 나의 눈동자에는 검푸르게 산그늘 드리운 강물이 숨을 죽여 낮게 흐르고 있을 것이었다. 네 개의 눈동자에는 손가락 틈 사이를 빠져나간 세월이 무심한 듯 안타까운 듯 투명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강바람에 흩어져 날리는 그녀의 자분치가 희끗희끗 세어 있었다. 성철스님의 오도송이던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물에 든다 해서 산이 물 될 수 없듯 물에 들어도 산은 그대로 산이요, 물도 산이 될 수는 없는 법. 어둠이 오면 산도 물도 모두 제 모습으로 어둠일 뿐이니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으랴. 어쩌면 인생이란 산도 물도 아닌 그저 흐름일 뿐이 아니겠는가. 앞서가는 그녀가 강둑길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자 강을 훌쩍 건너뛰어 바람을 타고 오르더니 구름을 밟고 넘어 그대로 푸른 하늘 속 한점 쪽빛으로 멀어져 간다. 저 아래로 여울이 보였다. 오후햇살에 조는 듯 고요히 흐르던 강물이 여울목에 다다르면서 제법 격한 소리로 흘렀다. 물가 작은 돌막 위에 해오리 한 마리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정물처럼 서서 고기가 지나가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해에 진섭이 가고 그의 2주기 때, 그녀는 예의 쪽빛 치마저고리를 입은 참한 모습으로 묘역에 나타났다. 의아하여 물었다. 차분하게 그녀가 답했다.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어서겠지요, 이 옷을 입은 저를 무척이나 좋아 하셨으니까요.” 여인의 자기 지킴에 있어 모시적삼 쪽빛만한 게 달리 또 있을까. 구름 한 점 없는 너른 하늘이 쪽빛으로 곱다. 2005. 7. 31. 湛 如 |
Comment 5
-
민경탁
2005.08.09 16:50
-
一水去士
2005.08.09 17:21
實話입니까? 100% or 50%??
(아니면 물어보는 놈이 병신인가... ??)
Gooldook의 쪽빛 물들이는 그 여인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
Just a thought of mine. No answer is necessary.
Just leave it as it is.
딴 홈피에 올리고 싶으시면 E-Mail 주시오. (stevenkim99@msn.com) -
一水去士
2005.08.11 09:40
Hi, 세윤兄;
"강물을 내려다보는 그녀"로 부터, 글의 내용이 깊어지고 방향이 더 뚜렸해지는거 같군요.
"네개의 눈동자" 전후의 글은 정말 잘 표현되어있고,
"저 아래 보이는" "여울의 격한소리"는 그때 강가에서의 두사람의 현실과 욕망을 의미하겠지요.
그러나 마즈막 글을보면 여울까지 못간채, 다시 잔잔히 제각기 돌아올수없는 길로 흘러간 모양이군....
"하염없이 기다리는" 해오리는 두 주인공을 각자 하나 하나로서 의미하는거 이고....
기다리는 동안 강물은 계속 흘러간다는것을 해오리는 아는지...
도전적이고 암시적인 그녀에 비해, 언제나 어쩔수없이 겸손하게 묶여진 주인공의 태도에 가여운 생각이 듭니다.
아득한 젊은 시절의 연정이 왜 이다지도 오래잊혀지지않고, 애들이 대학교 간 오늘도 번뇌를 일으킬가??
우리는 언제나 강둑에 서서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고있는 신세가 아닌지요?
그러니, 하염없이 바라보고만 있을게 아니고, 하여간 견지터를 찾았으면, 이제라도 낚시대를 던져
지나가는 고기 한마리라도 잡으려 노력하는게 우리가 할수있는 최선이 아닐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맘대로 되는것이 아니겠죠.
Amateur의 해석이니 그리알고.... 웃어도 좋습니다.
내가 미국에서의 내일생의 거의 전부를 Kentucky 에서 살았는데 그때 Ohio River 의
강둑이 내 바로 뒷마당 이였지요. 뒷마당에 나가면 언제나 소리없이 흐르는 강물이 보였읍니다.
밤이건, 낮이건 언제나 끊임없이 말이요....
어떤 힘이나 기적도 그 흐름을 정지시킬수없고 이미 지나간 흐름은 다시 돌릴수없다는것을 느끼며 살었지요.
인생도 마찬가지... 그때는 몰랐지만 아마 나의 조기 은퇴의 무의식 동기의 일부분이였을지 모릅니다.
강둑 길에 언제나 서있을수는 없는게 아니여서, 같이 흘러가도록 해야지요. 여울을 향해서....
자신의 뒤를 돌아보게하는 좋은 글이였읍니다.
우연히도 마침 들어온 이대일 동문의 타계소식에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군요.
그의 떠남도 결국은 흐르는 강물과 같은것.... "강둑 길"에 남아있는 우리들 역시... -
kyu hwang
2005.08.11 11:17
兄의
세윤형의 글에대한 評 동감이 많이 갑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강물에 씻어 보내기는
너무 애초롭고 소중한 추억 이기에
많은 어리석은 우리들은 가슴속 깊은
늪에 묻어두고 언젠가 마음속으로
크게 부르면 메아리 라도 되어
돌아 오기를 기대하는 아둔한 우리들이
아니 겠소.
그러기에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아름다운
추억들이 아니 겠소. 규정 -
물안개
2005.08.12 00:06
오랜만에 들렸습니다.
사춘기를 남녀공학인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에
우리들에게는 마음을 내보이지못하고 가슴에 묻어둔 애틋한 사연들이 많은가봅니다.
그분은 그후로 가까운 곳에 계시겠지만 멀게 지나시겠지요?
일수거사님 말씀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다시 돌아올 수 없이 멀리 가버린 세월만 가슴에 남아있어
.
.
.
무심히 흐르는 하늘의 한점 구름에서 쪽빛모시의 추억을 잡아보며.....
| No. | Subject | Date | Author | Last Update | Views |
|---|---|---|---|---|---|
| Notice | How to write your comments onto a webpage [2] | 2016.07.06 | 운영자 | 2016.11.20 | 18194 |
| Notice | How to Upload Pictures in webpages | 2016.07.06 | 운영자 | 2018.10.19 | 32348 |
| Notice | How to use Rich Text Editor [3] | 2016.06.28 | 운영자 | 2018.10.19 | 5925 |
| Notice | How to Write a Webpage | 2016.06.28 | 운영자 | 2020.12.23 | 43840 |
| 1794 |
쪽빛새?
[5] | 2005.08.04 | 성려 | 2005.08.04 | 6832 |
| » | 강둑 길, An essay by 오 세 윤 [5] | 2005.08.09 | 오세윤 | 2016.06.17 | 6710 |
| 1792 | 서울서 온 李大一 동문 부고 전합니다 [2] | 2005.08.11 | 一水去士 | 2005.08.11 | 7294 |
| 1791 | [re] 저구름 흘러 가는 곳 [2] | 2005.08.12 | 물안개 | 2016.06.17 | 7343 |
| 1790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詩) [5] | 2005.08.13 | kyu hwang | 2005.08.13 | 7695 |
| 1789 | 하! 하! 호! 호! [4] | 2006.11.26 | 석주 | 2006.11.26 | 8143 |
| 1788 | Napoli and Pompeii (Mediterranean 1) [9] | 2006.11.28 | 一水去士 | 2006.11.28 | 5731 |
| 1787 | Sorrento and Capri Island (지중해 2) [6] | 2006.11.29 | 一水去士 | 2006.11.29 | 7049 |
| 1786 | Amazing Magic Illusion [2] | 2006.11.29 | Sungja | 2006.11.29 | 7834 |
| 1785 | Athens, Greece (Mediterranean 3) [6] | 2006.11.30 | 一水去士 | 2006.11.30 | 6096 |
| 1784 | Christmas Blondes [3] | 2006.12.02 | 김성수 | 2006.12.02 | 7870 |
| 1783 | 한국 여행기, 친구들과의 등산 [5] | 2006.12.03 | kyu hwang | 2016.06.17 | 5991 |
| 1782 | Kusadasi, Turkey (지중해 4) [7] | 2006.12.03 | 一水去士 | 2006.12.03 | 6050 |
| 1781 | 비둘기의 속삭임 [9] | 2006.12.04 | 성려 | 2016.06.17 | 5720 |
| 1780 | 한국 여행기, 통영, 마산, 창원 여행 [7] | 2006.12.04 | kyu hwang | 2016.06.17 | 6459 |
| 1779 | Christmas Parade in Denver [2] | 2006.12.04 | 一水去士 | 2006.12.04 | 8775 |
| 1778 | Christmas Lights Parade 2006 [6] | 2006.12.05 | 김성수 | 2006.12.05 | 7271 |
| 1777 | 한 젊은 아버지의 슬픈 영웅적 행동 [6] | 2006.12.07 | kyu hwang | 2006.12.07 | 5992 |
| 1776 | [re] 안익태 / Korea Fantasy [6] | 2006.12.07 | 석주 | 2006.12.07 | 5836 |
| 1775 | 일본 여행기, Osaka 와 Kobe 지역 [16] | 2006.12.07 | kyu hwang | 2006.12.07 | 6289 |

근 45 년전,
황순원의 소나기,
주요한? 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 인가를 읽었는데,
그기억이 위의 백두산 사진 처럼 제 머리에 진한 도장을 찍어 놨는데 그이유를 두고 두고 생각해 봣소!
결론은 자신이 그려보는 모든 이상적인 아름다음을 우연히 지나가는 대상에 투사한것이 안니가 하오!
물론 비극적인, 씁쓸한, 육감적인, 시적인, 회화적인,.. 모든 종류의 아름다움에다!
또 황대감이 "민가 너무 심각하진다" 쿠사리 할것이 두려 우나,..
여기 그림하나 들어, 간단히 얘기 하껫소..
이 아래 그림이 뉴욕 Metropolital Museum 일층에 있는
Pablo Picasso가 미국여자 Sara Murphy를 안쳐 놓고 그린그림이요..
물론 정력이 황성한 젊은시절에...
이그림은 잘보면, 먼지가 뿌엿게 낀 액자에 넣은 희랍 조각 사진 같이 그려 놧소.
이태리 여행한 후 갑자기 고대 조각에 심취해서,... (청색시대이후 "고전시대" 라고도 하는 시기의 그림),
미국 여자가 희랍조각으로 둔갑한 그림!
그러나 머리 카락을 보면 그방 목욕한 후 윤기 나는 여인의 머리가 어깨 뒤로 넘어가고 있오!
이 사진은 우리 안방 가운데 걸어논 포스터를 지금 밖에서 찍어 올리는데,
내가 옛날 홀딱 반한 그림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안방에 걸려있소!
이 피까소 그림이나, 형이 쓴 모시적삼 입은 여인이 모두 아름다운것은 오형의 능숙한 그림이란 애기요!
물론 모시적삼 입은 女人이 오형의 모델로 45 년간 살아온 것이 아니오?
그분이 오형의 靈感을 불어 일으킨것 만은 110% 수긍하오!
서울가면 그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약속 하신대로 낙시도 근처서 할겸!
항상 속편이 있게 마련이고,..
참으로 형 그림 솜씨가 삼베 짜는 기슬 비슷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