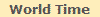






- Total
- General
- Arts
- Book
- Culture
- Economy
- Essay
- Fun/Joke
- History
- Hobbies
- Info
- Life
- Medical
- Movie
- Music
- Nature
- News
- Notice
- Opinion
- Philosophy
- Photo
- Poem
- Politics
- Science
- Sports
- Travel
석주님이 올린 구노의 '아베마리아'에 젖은 감동으로 그날 밤, 난에 얽힌 개인적 경험을 글로 엮어 오늘 완결했기에 여기 올립니다. 조금 미완성인때의 글은 굴뚝에도 잠시 올렸더랬습니다. 모두가 다 난 향 같은 삶이기를...... 蘭 香 오 세 윤 우리는 서로의 무엇에 이끌리는 가, 외모일까 내면일까. 벌과 나비는 꽃의 무엇에 더 이끌리는 가, 색깔인가 향기인가. 6월 들어 산길에 갓 피어나는 산나리는 첫 꽃잎 벌음이 너무 수줍어 한사코 아래만을 향해 핀다. 겨우 곁눈질만으로 사람의 시선을 끈다. 꽃 빛도 순하다. 그러다 세찬 장맛비를 맞으며 7월 초순을 넘기면 스스로의 향 없음을 공시라도 하듯 여름 기운에 거세진 대를 한껏 곧추세워 올리고 하늘을 향해 꽃잎을 있는 대로 벌린다. 부끄러움마저 헌신짝이듯 훌쩍 던져버리고는 헤식게 웃고 선다. 두터워진 꽃잎에 색깔도 진해진다. 조화(造花)의 향 없음과 상통하는가. 어쩌다 숲 속에 만나는 한 둘은 그런대로 반갑다. 다만 무더기로 모여 핀 모습은 때로 무감(無感)하여 바라보기 민망하다. 지난 늦가을, 빌려 본 책을 반환하려 3호선 전철을 탑골에서 내렸다. 일본 대사관을 향해가는 길이 마침 운현궁 문전을 걸쳤다. 문 앞 채 못 미처, 생각 없이 옮겨놓는 발길이 코에 스미는 은은한 향에 걸려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만다. 난향이었다. 마침 ‘서울란회(蘭會)의 스무돌잔치가 운현궁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전혀 예상 못한 만남, 기연이었다. 어느 결에 문안으로 발을 들여 놓는다. 정갈한 마당에는 짙은 난향이 가을호수의 물결무늬처럼 난감하게 어우러져 흘러 넘쳐나고 있었다. 마침 는개 같은 가을비가 내리고 있어 향이 낮게 머무른 때문이기도 하겠다. 한란(寒蘭)을 비롯해 춘란(春蘭) 풍란(風蘭) 혜란(蕙蘭), 백서른세개의 난분(盆)이 운현궁 내 곳곳에 가득 전시되고 있었다. 중심건물인 노락당(老樂堂)에는 주로 품격 높은 한란을, 노안당(老安堂)에는 춘란과 풍란을 볼품 있게 전시했다. 안채인 이노당(二老堂)에는 특별히 격조 있는 한란 두 분을 놓아 주인 부대부인(府大夫人)의 아향(雅香)을 고상하게 돋우어 나타냈다. 청향에 더하여 자태마저 고고한 한란은 무슨 뜻에서인지 그 출처를 따로 구분하여 한국한란, 일본한란, 중국한란으로 나누어 명패를 달았다. 별채인 행랑채의 쪽마루와 그 안에는 무늬가 다양하고 화려하여 그 엽예(葉藝)를 즐기는 혜란(蕙蘭)이 전시되고 있었다. 가을이라 소심란(素心蘭)이 한창 꽃을 피워 맑은 향을 가득 주위에 퍼뜨리고 있었다. 한옥의 운치야 어느 때라 같을까. 아침저녁에 따라서도, 계절에 따라도 그 멋스러움이 다르다. 난향 어우른 추색 짙은 운현궁, 어슬한 대청에서는 방금 난이라도 한 폭 친 대원군이 도포자락을 여며 잡고 섬돌 아래로 내려설 듯 청려한 고풍이 예나 그대로다. 달포 전, 철학과 남(南)교수의 사랑방에 일없이 들렀을 때 있었던 일. 수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인사동에서 구했다며 대뜸 5,6호 크기의 표구 된 ‘蘭’ 한 폭을 내보인다. 대원군이 말년에 친 난이라고, 진품이라며 오랜 지면의 고화 점(古畵店)주인이 소장하기를 권해 가지고 왔다 밝히면서도 미덥기가 덜한지 고개를 갸웃하여 내 눈치를 살핀다. 그림에 눈을 준채 핀잔이듯 한마디 했다. “영인본이면 어때서? 걸어놓고 보는 거야 다 마찬가진데.......” “그래두-” 대답이 찜찜하다. “왜 갑자기 투자라도 하고픈 생각이 난거요?” 고깝게 들을 만도 한데 역시 학자다. “그게 아닐세, 향기는 진품이라야만 나거든.” 한 수 위다. 숲에 드는 것도, 산에 드는 것도 그 모두 나무와 바위, 산마루에 걸친 구름과 하늘빛의 향이 있어서가 아니겠는가. 개발이란 명목으로 깎여 허리를 드러낸 산, 인위적으로 비틀리고 가지를 쳐 자연스러움을 잃은 나무, 어둡게 탐욕에 물든 사람에게는 생감이 없다. 향이 없다. 다만 추한 속(俗)과 속되게 꾸며진 외양만이 있을 뿐이다. 세월에 얹혀 흐르면서 가장 경계해야할 일이 바로 향의 가심일 듯. 향이 가신 꽃은 외양뿐이요 사람 또한 굳음만이 있을 뿐이다. 굳음은 쇠함이요 죽음이다. 옛날 노자(老子)가 임종에 든 스승 상용을 찾아 마지막 가르침을 청했을 때, 상용은 말없이 입을 벌려 ‘부드러움의 힘’을 가르쳤다. 딱딱한 이빨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입, 부드러운 혀와 입술은 끝까지 남아 주인의 몸을 살아있게 한다는 귀한 가르침을 주고 떠났다. 香은 사랑이요 용서요 너그러움이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남긴 것도 사랑이요 용서다. 바로 향이다. 석가 또한 그러하지 아니한가, 입적하여 이레 동안 불이 붙지 않던 다비장, 사랑하는 제자 가섭이 오고서야 관에서 한쪽 발을 내어 반가운 인사를 한 뒤 겸허히 이승을 떠났다. 그 모두 자비요 너그러운 향의 한 모습이다. 공자가 귀담아 듣기 쉽지 않은, 실행하기는 더욱 어려운 그 많은 ‘지당한 말씀’을 하고도 이제껏 널리 추앙받음도 그의 겸허한 덕과 너그러움 때문이 아니겠는가. 제자 증자(曾子)가 스승께 도(道)를 묻자 하신 말씀도 이에서 전혀 다르지가 않다. - 나의 도는 하나로 꿰어있다, 다만 충서(忠恕)일 따름이다. - 我道也 一以貫之 , 忠恕而已矣 - 6,7월의 숲, 날이 밝으면서부터 아침나절 내내 새끼를 가르치느라 급하게, 산이 쩡쩡 울리도록 강강하게 울던 뻐꾸기도 새끼가 제 뜻을 따라주어 울기와 날개 짓을 제법 배워 익힌 오후가 되면 숲의 좀 더 깊은 곳으로 찾아들어 여유롭게, 느긋하게 운다. 수고한자의 자애로운 여유다. 바로 사랑이요 향이다. 사람이 되어 미물만 못하다면 어찌 쓸만하다 이르랴. 2005. 7. 10. 慧 明 |
Comment 4
-
kyu hwang
2005.07.15 01:45
-
석주
2005.07.15 03:05
오박사님, 제가 올린 구노의 아베마리아에 그렇게나 큰 감명을 하시어
단숨에 글까지 쓰셨군요 !
아직도 소년의 감수성과 순수함을 지니셨기 때문이고
글재주?가 특출하시기 때문이시리라 생각합니다.
난향같은 삶을 생각 해보고 살아가도록 격려 해 주신 좋은 글 고맙습니다. -
물안개
2005.07.15 04:04
"숲에 드는 것도, 산에 드는 것도 그 모두 나무와 바위, 산마루에 걸친 구름과 하늘빛의 향이 있어서가 아니겠는가."
하늘이 흐린날은 강물도, 바닷물도 회색빛으로 어둡지요.
향을 잃지않는 유연한 삶,,,,,
참으로 힘든 길입니다.....그래도 다시 마음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
一水去士
2005.07.15 15:25
흥미있는 기사, 바로 오늘 아침 뉴스입니다. 보다가 윗글이 생각나 가져왔읍니다.

| No. | Subject | Date | Author | Last Update | Views |
|---|---|---|---|---|---|
| Notice | How to write your comments onto a webpage [2] | 2016.07.06 | 운영자 | 2016.11.20 | 18157 |
| Notice | How to Upload Pictures in webpages | 2016.07.06 | 운영자 | 2018.10.19 | 32297 |
| Notice | How to use Rich Text Editor [3] | 2016.06.28 | 운영자 | 2018.10.19 | 5882 |
| Notice | How to Write a Webpage | 2016.06.28 | 운영자 | 2020.12.23 | 43802 |
| 1834 | 농담 몇마디 [4] | 2005.05.20 | kyu hwang | 2005.05.20 | 6852 |
| 1833 | [re] 내가 산으로 가는 것은 [2] | 2005.05.23 | 물안개 | 2005.05.23 | 7745 |
| 1832 | [re] 태그에 대하여(퍼옴) [4] | 2005.05.23 | 물안개 | 2005.05.23 | 7061 |
| 1831 | 이해인 수녀님과 법정 스님의 편지 (퍼옴) [14] | 2005.05.22 | 석주 | 2005.05.22 | 7361 |
| 1830 | The Garden Of the Gods, Colorado Springs, CO [3] | 2005.05.26 | 一水去士 | 2005.05.26 | 8675 |
| 1829 | 아버지의 찔레꽃 [12] | 2005.06.03 | 오세윤 | 2005.06.03 | 6921 |
| 1828 | 장미꽃다발과 졸업하던 날 [5] | 2005.06.03 | 물안개 | 2005.06.03 | 6954 |
| 1827 | 수필집 '바람도 덜어내고' 받은 날 [20] | 2005.06.10 | 물안개 | 2005.06.10 | 7080 |
| 1826 | 법정스님의 "무소유" 에서 [6] | 2005.06.10 | 一水去士 | 2005.06.10 | 6259 |
| 1825 | 순수한 모순 [4] | 2005.06.10 | 석주 | 2016.06.17 | 7618 |
| 1824 | [re] 우스개 [3] | 2005.06.27 | 물안개 | 2005.06.27 | 7498 |
| 1823 | Senior Citizen Jokes [2] | 2005.06.26 | YonnieC | 2005.06.26 | 6269 |
| 1822 | 열어 보지 않은 선물 [7] | 2005.07.02 | 석주 | 2005.07.02 | 6736 |
| 1821 | A Quiet Evening Of Birmingham Michigan [5] | 2005.07.04 | 이 한중 | 2005.07.04 | 17065 |
| 1820 | 청포도 계절에 .. (詩 청포도- 이육사) [5] | 2005.07.05 | kyu hwang | 2005.07.05 | 7903 |
| 1819 | Canadian Rockies (퍼옴) [5] | 2005.07.06 | 석주 | 2005.07.06 | 7647 |
| 1818 | 7월,,,장마 속의 빗소리 [4] | 2005.07.10 | 물안개 | 2005.07.10 | 8320 |
| 1817 | 바흐 - 구노의 아베 마리아(합창곡) [3] | 2005.07.12 | 석주 | 2005.07.12 | 8032 |
| » | 蘭 香 [4] | 2005.07.14 | 오세윤 | 2005.07.14 | 6542 |
| 1815 | 농담 몇마디 [4] | 2005.07.14 | kyu hwang | 2005.07.14 | 7189 |

六感의 世界(inner world)가 있읍니다.
우리같은 凡人들이 가끔 느끼는 육감(the six sense,
intuition,or ESP)은 이 육감세계의 극히 일부라고 생각 합니다.
凡人들은 항시 五感에 억눌리어 六感의 世界에 오래 머물지 못하나
예수님 이나 부처님 같으신 超人들은 예수님의 그 크나큰 사랑을
통해 부처님의 刻苦끝에 大悟를 통한 慈悲心으로 육감의 세계에
계시다고 봅니다.
세윤兄께서 난초에서 나오는 香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열어
사랑, 용서, 너그러움 으로 육감의 세계에 들어갈수 있는 암시를 해준
좋은글 이라고 생각합니다.
不惑을 훨씬 넘어 耳順의 경지에 있는 우리들로서 한번쯤 생각해볼
일이 아닐까? 잠시 개똥철학 죄송합니다.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