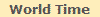






- Total
- General
- Arts
- Book
- Culture
- Economy
- Essay
- Fun/Joke
- History
- Hobbies
- Info
- Life
- Medical
- Movie
- Music
- Nature
- News
- Notice
- Opinion
- Philosophy
- Photo
- Poem
- Politics
- Science
- Sports
- Travel
Essay [Essay] 특별한 날 먹던 자장면 / 박찬일
2011.04.18 18:58
 [중앙일보] [Daum Media] [중앙일보] [Daum Media]특별한 날 먹던 자장면 / 박찬일 볼 미어져라 먹는 딸을 보다가, 부모님 생각에 울컥했다
박찬일 음식 칼럼니스트 < chanilparknaver.com > |
Comment 5
-
유석희*72
2011.04.18 19:43
-
계기식*72
2011.04.18 21:10
저도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훈련받을 때, 제일 생각나는 음식이 짜장면이더라구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수련 받을 때, 저도 짜장면 특곱배기(계란 후라이 얹은 곱배기)를
즐겨 먹었지요...
음식 잘하는 중국집에서는 짜장면 맛이 언제나 맛있더라구요.. -
방준재*70
2011.04.19 16:35
Several years ago in Seoul,
Rachel wanted to treat me a lunch
at the hotel where I stayed.I asked her to take me to a Chinese
restaurant for a Bowl of "Jja-jang-myeun".5,000 Won,
The price said on the wall.
I cleaned the bowl and smiled at her.
Tasted better than 40,000 Won buffet lunch
at the hotel.It was not just a bowl of "Jja-jang-myeun".
It was a Bowl, Full of Nostalgia. -
운영자
2011.04.19 19:04
우리가 미국에 처음 왔을때는 짜장면을 큰 도시에 가서도 사먹기 어려웠지요.
그당시 중국집들은 모두 Mandarin style, 맛없는 음식들...
그러다가 박정희에게 쫓겨난 중국화교들이 대량 미국으로 건너오자, 짜장면과
한국식 중국요리가 여기저기 작은도시에까지 퍼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불편없이 즐길수있지요. 누구의 덕택인지... -
방준재*70
2011.04.20 23:09
Yesterday after golf,
I had "Jja-jang-meun"
as my dinner, "Ggop-bae-gi-ro".There was No Strugle to Choose
between "Jjjam-bbong" and "Jjja-jang-meun"
as the author said.And the choice was right one
because it tasted good. No Regret!
| No. | Subject | Date | Author | Last Update | Views |
|---|---|---|---|---|---|
| Notice | How to write your comments onto a webpage [2] | 2016.07.06 | 운영자 | 2016.11.20 | 18193 |
| Notice | How to Upload Pictures in webpages | 2016.07.06 | 운영자 | 2018.10.19 | 32348 |
| Notice | How to use Rich Text Editor [3] | 2016.06.28 | 운영자 | 2018.10.19 | 5925 |
| Notice | How to Write a Webpage | 2016.06.28 | 운영자 | 2020.12.23 | 43840 |
| 385 | [연재수필] "앙가르쳐주우~지.." [5] | 2011.03.18 | 이기우*71문리대 | 2011.03.18 | 6877 |
| 384 | 최근의 카이스트 대학 사태/논란에 대해서 - 이병욱 [2] | 2011.04.12 | 운영자 | 2011.04.12 | 8043 |
| » | [Essay] 특별한 날 먹던 자장면 / 박찬일 [5] | 2011.04.18 | Rover | 2011.04.18 | 7178 |
| 382 | [시사평] 정치인이 장수하는 나라의 불행 [1] | 2011.04.18 | 임춘훈*Guest | 2011.04.18 | 7024 |
| 381 | [re] 아버지란 이름의 조금은 서글픈 자화상 [2] | 2011.05.03 | 운영자 | 2011.05.03 | 7878 |
| 380 | 철짜법에 대한 바른말 한마디 [2] | 2011.04.23 | 운영자 | 2011.04.23 | 6903 |
| 379 | 매화頌 [8] | 2011.05.02 | 김 현#70 | 2011.05.02 | 6447 |
| 378 | 준재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길 [2] | 2011.05.04 | 김창현#70 | 2011.05.04 | 6302 |
| 377 | [Essay] 시인과 대통령 [2] | 2011.05.05 | Rover | 2011.05.05 | 6844 |
| 376 | [Essay] On May, 2011 [1] | 2011.05.10 | 장원호#guest | 2011.05.10 | 7118 |
| 375 | 고양이들의 근황 [8] | 2011.05.15 | 황규정*65 | 2011.05.15 | 5783 |
| 374 | [Essay] 5.16 50주년과 박정희 (김 진) [6] | 2011.05.16 | 운영자 | 2011.05.16 | 5578 |
| 373 | 목단 頌 [3] | 2011.05.18 | 김창현#70 | 2011.05.18 | 10044 |
| 372 | 진안 원연장마을 꽃잔디 동산 [2] | 2011.05.24 | 운영자 | 2011.05.24 | 5990 |
| 371 | [단편] A Nervous Breakdown by Anton Chekhov [2] | 2011.06.06 | 운영자 | 2011.06.06 | 2140 |
| 370 | [Essay] '신경쇠약' [1] | 2011.06.05 | 정유석*64 | 2011.06.05 | 5513 |
| 369 | [Essay] 신형 '바버리 맨' | 2011.06.05 | 정유석*64 | 2011.06.05 | 5134 |
| 368 | [Essay] '바보들의 배' | 2011.06.07 | 정유석*64 | 2011.06.07 | 5021 |
| 367 | [Essay] 캐더린 앤 포터 | 2011.06.07 | 정유석*64 | 2011.06.07 | 5052 |
| 366 | [re] Did Japanese learn anything ? [1] | 2011.06.17 | 운영자 | 2011.06.17 | 7687 |


먹고싶은 음식은 병원식당의 자장면이었지요.
제 2년선배에 순환기 하시던 김 명식선생님,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은 허구헌날 병원식사가 오로지 자장면이었습니다.
자장면 곱빼기, 계란 후라이 하나 얹은 특 자장면 등이 갑자기 먹고싶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