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이제 알아들을 수 있구나.” 실험을 하다 잠시 저녁 먹으러 온 남편에게 흥분한 어조로 자랑했다. “그래, 그러면 이젠 간호사 시험만 붙으면 되겠네.” 남편은 대견하다는 듯 씩 웃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미국 간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제 일자리를 찾을 차례였다. 신문 광고를 보고 몇 군데 이력서를 냈더니 한 곳에서 연락이 왔다. 미국 병원 경험도 없고 시스템도 몰랐으므로 큰 병원은 자신이 없어 작은 요양병원을 택했다. 인터뷰를 하는데 이번엔 말이 문제였다. 간호과장 질문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Pardon me? Could you repeat it for me?”를 몇 번 하다가 “I will do my best”라고 한마디하고는 될 대로 되라는 기분으로 나와버렸다.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합격 소식이 날아왔다. 미국 간호사로서 첫발을 내디디게 된 것이었다. 약국으로 숨어들기 유학생 가정에 차가 한 대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버스 통학이 되지 않는 학교로 남편이 차를 가지고 가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내 출근길이 막막했다. 하여 난 밤일을 택했다. 남편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밤 11시까지 출근하는 나를 병원에 데려다주었다. 아침 7시 퇴근 시간에 맞춰, 남편은 잠이 덜 깬 아이를 담요에 둘둘 말아 차 뒷자리에 싣고 나를 데리러 왔다. 그리고 나와 아이를 집에 내려놓고는 서둘러 학교로 향했다. 나는 아이에게 아침을 먹이고 숙제를 점검하고 준비물과 가방을 챙겨 통학 버스에 태우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과 학교에서 갑자기 일이 생겨 중간에 아이를 데리러 가거나 하게 되면 난감했다. 동네 이웃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쉽지 않았다. 차가 한 대 더 필요했지만 차를 사기엔 유학생이라는 신분과 할부금이 부담됐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기로 했다. 밤 근무를 6개월쯤 했을까. 낮일을 하던 간호사 한 명이 사직을 했다며 내게 낮 근무를 할 수 있느냐고 물어왔다. 영어 때문에 걱정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밤잠을 못 자는 것보다는 낫겠지 싶어, 선뜻 “Yes”라고 답했다. 그리고 이번엔 내가 남편과 아이를 새벽같이 데려다주고 퇴근 후 데리러 가는 것으로 일정을 바꿨다. 남편은 일찍 학교를 가도 할 일을 할 수 있고 도서관도 있으니 괜찮지만 아이는 오전 7시 전엔 학교를 갈 수 없었으므로 또 이웃의 신세를 져야 했다. 새벽, 아이를 깨워 아침 먹이고, 학교 갈 준비를 시켜 이웃집으로 보내면 이웃 아이들과 함께 스쿨버스를 탔다. 아이가 하교할 무렵엔 나도 퇴근을 해 아이를 야구와 태권도 모임 등에 데려갈 수 있었다. 그러나 더 큰 일은 병원에서였다. 아무리 노력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차트를 보고 약을 주거나 의사의 오더를 시행하는 건 문제없었다. 문제는 전화였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환자 주치의나 환자 보호자와 연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제일 곤혹스러웠다. 내 딴에는 또박또박 상황을 전달했다 싶은데도 상대편에서 못 알아들어 되묻고 또 되묻고 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환자에게 연락을 해야 할 때는 함께 일하는 조무사에게 시키면 되지만 전화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할 때는 의료법상 반드시 내가 해야 했다. 스펠링을 물어보거나 천천히 말해달라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꾀를 낸 것이 전화를 피하는 방법이었다. 전화가 울리면 난 잽싸게 약국으로 들어갔다. 병동의 약국은 간호사실 뒤에 붙어 있어 들어가기가 쉬웠다. 전화가 아무리 오래 울려도 난 약국에서 무언가 급한 일을 하는 척하며 위기를 피했다. 전화가 오래 울리면 간호감독이 받아 의사의 처방을 적어서 내게 갖다 주곤 했다. 미국인 간호감독이 적어준 것이니 틀릴 일은 없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눈치를 챈 간호감독이 나를 자기 방으로 불렀다. 더는 피할 수 없겠구나 싶어 솔직히 털어놓았다. 전화 받기가 가장 두렵다고. 간호감독은 내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전화가 울리면 둘이 동시에 받고, 둘이 동시에 적어, 둘이 내용을 맞추어본 후 차트에 옮겨 적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너무나 고마웠다. 그 후 전화가 오면 감독과 나는, 서로 연결돼 있는 전화기로 동시에 받았다. 내가 좀 틀리고 못 알아들으면 그녀가 정정을 해주었고, 나쁜 발음은 그 자리에서 교정해주었다. 그리고 서너 달 후, 그녀는 “이제 혼자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려주었다. 그때, 그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두려움에 떠는 새가슴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자신 있게 전화를 받고, 거의 매일 스무 통화 이상 전화를 하고, 매일의 시작과 끝을 e메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 다시 또 생각해도 참으로 고마웠던 분, 이미 퇴직했겠지만 어디선가 아직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곱게 백발을 만들어가고 있으리라 믿는다. 지금도 병실 약국에 오래 있는 신참 간호사를 보면, 물론 투약 준비를 하는 것이겠지만, 혹 불편한 시간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옛날의 나를 기억하며 들여다보게 된다. “뭘 좀 도와 줄까? 바쁜 일 있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얘기해.” 가벼운 이야기를 붙여보면서 말이다. 이층 세 주었냐? 말문이 트이고 전화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자 병원 생활에 자신이 붙었다. 간호사가 부족했던 탓에 오후까지 이어지는 오버타임을 많이 했고 통장의 잔고도 조금씩 늘어갔다. 그러자 남편은 집을 사자고 제안을 해왔다. 아직 유학생 신분인데 좀 이른 것 아니냐 싶었지만, 간호사 취직이 되고 영주권도 조만간 나올 것 같아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집을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싶었다. 영주권이 나오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살 수 있고 주민으로 인정받아 학비 감면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미국 생활은 술술 잘 풀려갔다. 다만 유학을 떠날 때 반드시 귀국하겠노라 약속했던 홀어머니가 마음에 걸렸다. 여러 채의 집을 보고 나서, 아이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결정했다. 지금이야 돈 많은 유학생도 많지만, 그때만 해도 다들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쪼개고 아끼며 살았었는데 우리는 유학생 가족 중 유일하게 내 집을 가진 집이 되었다. 이층집! 집을 산 뒤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자, 제일 먼저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었다. “이층집이라며? 이층 세는 주었니?” 한국식으로는 이층집의 경우 한 층에 주인이 살고 나머지 층은 전세를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아래층에는 방이 없어요. 이층에만 방이 네 칸인데 부엌은 일층에 하나고, 이층으로 직접 통하는 입구도 없어서 세를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미국엔 전세라는 게 없어요.” “그럼 두 층 다 너희 세 식구만 쓴다는 거야? 낭비다, 낭비…… 뭐 그리 신통치 않은 집이 다 있냐? 별 쓸모가 없게 생겼나 보네.” “아니에요. 아주 아담하고 예쁜 집이에요. 우리한텐 딱 맞아요.” “그래도 이층이라면 세도 좀 주고 실용성이 있어야지…….” 설명이 길었지만 어머니는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었다. 다음 해, 어머니가 직접 와보시고야 이해를 했다. 미국에서 첫 번째 집을 사고 이사를 하던 날, 그 설렘은 어떤 말로도 표현이 되지 않는다. 일생을 살면서 가장 기뻤던 날은, 첫 번째는 아들을 낳은 날, 두 번째는 미국 간호사 시험의 합격통지서를 받은 날, 세 번째는 영주권을 받은 날이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미국에서 처음 집을 사 이사를 하던 날이다. 친정의 가족력으로 보아 아들을 낳는 것은 무척 어렵게 느껴졌고 심한 입덧 탓에 아이는 하나면 족하다고 생각했었다. 하나인 아이가 아들이라니 그리 든든할 수가 없었다. 요즘은 딸이 아들보다 낫다고들 하며, ‘아들’ 운운하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 ‘성차별주의자’라고 하겠지만 아직도 난 아들이 더 든든하다고 믿는다. 간호사 시험의 합격은 곧 미국에서의 ‘고생 끝’으로 이어지며, 간호사 자격증 하나면 미국에서 사는 데 등심 줄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묻는다면 다소 머뭇거릴 테지만,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개도 안 먹는다는 영주권! 주민등록증같이 생긴 작은 증명서! 미국에 살며 영주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적법성의 여부를 떠나 학비와 세금, 보험과 노후문제로 이어지는 것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다르다.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에서의 생활은 살얼음을 디디는 것처럼 불안하고 조심스럽다. 이런 것들을 가슴으로 기억하며 미국을 살아낸다. 내 나라 내 땅이 아니므로 아직도 조심스럽고 불편한 것이 많지만, 미국에서 산 시간과 한국에서 살았던 시간이 거의 비슷해지는 지금, 이곳에서 내린 뿌리를 더욱 실하고 단단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층을 세 주지 못해 전세금이 안 나왔어도 평생 갚아야 하는 집값이 내 발목을 잡고 있어도, 일하는 만큼, 능력만큼 차근차근 블록을 쌓듯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미국이니까 말이다. 또 하나의 도전 새집에서의 생활에 점차 틀이 잡히고 아이도 동네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등·하교를 함께하게 되자 생활은 더욱 안락해졌다. 성격상 한자리에서 안주하지 못하는 나는 다른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다. 우선 미국의 노인 요양병원에서 1년 반 정도 근무했으니 그 다음 단계인 종합병원으로 옮겨보기로 했다. 늘 지나다니며 일해 보고 싶었던 가톨릭재단의 병원이었다. 이력서를 넣고 기다리는 동안 간호과장에게 큰 병원에 이력서를 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녀는 기회가 된다면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늘 격려해주었는데, 아무리 말려도 갈 사람은 간다고 생각했던 때문이 아닌가 싶다. 드디어 큰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다. 처음엔 ‘Floating’이라고 하여 여러 층을 돌아다니며 갑자기 입원 환자가 늘어난다든지, 누군가 결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자리를 메워주는 역할을 맡았다. 딱히 정해진 자리가 아니고 여러 병동을 돌아다니게 되자 일은 손에 안 잡혔고 한국에서 배웠던 간호학의 한계가 피부에 와 닿았다. 청진기를 들고 환자의 심장소리를 듣거나, 호흡의 패턴을 보고 환자를 진단하고 간단한 엑스레이를 판독하거나 환자의 병력을 조사해 간호 진단을 하는 일들은 정말 생소했다. 물론 요양병원에서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다. 경험 없이 부딪힌 일들로 무척 당황스러웠고, 괜히 옮겼나 싶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또 다른 도전이 필요했다. 다행이었던 것은 일하는 시간이 하루 12시간으로 일주일에 3일만 하면 풀타임으로 쳐주었던 점이다. 일주일에 4일을 쉴 수 있어 시간이 있을 때 간호학 공부나 더 해 두어야겠다 싶어 학교에 등록을 했다. 학교는 또 하나의 도전이었다. 처음에는 당면 과제인 인체 진단과 검사학(Physical assessment · diagnosis) 한 과목을 들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신체를 검사하는 과목으로, 한 학기가 끝나자 환자가 입원해 들어왔을 때 주의해 살펴야 하는 것들이 쉽게 눈에 들어왔다. 그뿐만 아니라 청진기를 들고 심장소리, 호흡소리를 듣는 것 등에도 능숙해졌다. 동시에 병원 자체에서 제공하는 재교육 프로그램과 신참 간호사를 위한 세미나에도 빠지지 않았다. 미국 병원의 체계와 조직, 의학과 간호학 시스템을 모르며 시작했던 큰 병원의 생활은 좌충우돌, 정신이 없었지만 몸으로 부딪치는 것보다 더 좋은 선생은 없었다. 그때 나는 풀타임 간호사이면서 동시에 풀타임 학생, 파트타임 엄마, 파트타임 마누라였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영어에 매달렸다. 두 번째 학기에는 두 과목 수강 신청을 했고, 세 번째 학기에는 정식으로 간호학과 학생이 되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간호학 석사과정 준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목들을 수강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네 번째 학기가 끝날 무렵, 남편의 박사과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었다. 그러나 난 아직 이수해야 할 과목들이 남아 있었고 졸업시험도 봐야 하는 등, 일이 겹쳐졌다. 이왕 공부를 시작한 것이니 미국의 간호학사라도 해둬야 할 것 같았고, 석사과정 준비도 미리 해두어야 했다. 두 학기는 더 해야 될 것 같아, 남편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박사과정 마치는 것을 좀 천천히 하라고. 다행히 남편의 지도교수는 실험 한 가지를 더하는 조건으로 그의 과정을 연장해주었다. 그리고 일 년 후, 같은 날 같은 교정에서 그는 박사 학위를, 나는 간호학사 학위를 받았다. 남편은 박사과정이 끝나자 바로 박사 후 연구원(Post-Dr.)이 되어 떠났고 나는 혼자 이삿짐을 챙기고 집을 세놓은 뒤 몇 달 후 아이와 함께 뒤따라갔다. 남편이 먼저 도착한 샌타크루즈(Santa Cruz)는 아주 작은 도시였으므로 병원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력서를 내자 중환자실밖에 자리가 없단다.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고, 미국에서 공부도 했는데 중환자실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어 수락했다. 그러나 중환자실은 삼엄한 긴장이 나를 억눌렀고 갖가지 복잡한 기계들이 쉴 새 없이 삑삑거려 정신이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많은 약물. 몸 전체에 달려 있는 기구들과 복잡한 선들. 그리고 각종 색깔의 선을 그리거나 쉬지 않고 숫자를 알려주는 모니터가 눈길을 붙잡았다. 중환자실에 들어서자 아차 싶었지만 하겠다고 한 일을 번복할 수는 없었다. 미국 병원 생활에 조금 익숙해지고 자신이 붙었는데 다시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그전엔 중환자실에서 일한 경험이 없어 3개월의 수습기간이 주어졌는데, 그동안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배웠다. 어떤 환자가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며 무엇부터 처리해야 환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지를 늘 생각했다. 실수가 없자 의사들이 신임했고 주임간호사들도 심각한 상태의 환자가 들어오면 꼭 내게 맡겼다. 그리고 또다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며 무모한 도전은 없는 것이란 생각도 들었다. 조금은 자만 같지만 사람은 누구에게나 맡겨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 (다음 webpage에 계속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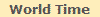







The story began like ours in the beginning of our life in America.
When phone rang,
no matter what time it was,
no matter where we were,
we' Rushed to the Place
where phone came from.
We were Firefighters, Not Physicians,
to Extinghish Fires.
It is America where English is the King of the Road.
No English, No-Nothing, but Fears!, and the Time of
Loneliness_as a social outcast.
PS; I like the Title and the very beginning of the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