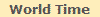






- Total
- General
- Arts
- Book
- Culture
- Economy
- Essay
- Fun/Joke
- History
- Hobbies
- Info
- Life
- Medical
- Movie
- Music
- Nature
- News
- Notice
- Opinion
- Philosophy
- Photo
- Poem
- Politics
- Science
- Sports
- Travel
Essay [강민숙의 연재수필] 홍천댁 15 - 들밥
2011.08.30 03:02
Comment 5
-
이기우*71문리대
2011.08.30 03:22
-
노재선*66
2011.08.30 04:26
우리가 살던 고향에서는 들밥이라 부르질 않고 딴 이름이 있었는데 생각이 나질 않는군요 한데 논에서 일을 할때는 항상 논에 달려가 일하는 아저씨들과 함께 들밥을 맛있게 먹었든 생각이 나는군요
이제 곧 홍천댁이 떠나게 되겠군요 그동안 재미 있게 읽고 있었는데 섭섭하고 아쉬움만 남게 되었답니다
계속해서 속편이 있길 기대하면서- - - - - -.先으로 부터
-
황규정*65
2011.08.30 06:59
보통 농촌에서 아침,점심,저녁사이에 일하다 먹는밥을
'새참'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규정 -
노재선*66
2011.08.30 08:03
"새참"이라고 했던것 같읍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단어라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색하게 느끼는건 조국의 아름다운 풍습과 습관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두 잊고 살아 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기에 홍춘댁을 더욱더 흥미 있게 읽고 있답니다
규정님에게 감사를 많이 보냅니다先드림
-
운영자
2011.08.30 09:31
지금까지도 생각나는게 있다. 이글을 읽으며 새삼스럽게 옛기억을 더듬는다.
가을에 추수할때에는 어른들이 벼를 짤르고 볏단을 만들어 논에 세워 놓는다.
그동안 우리는 외사촌 누이들과 함께 이제는 텅 빈 논에서 "우렁"을 잡었다.
젖은 진흙같은 논 흙속에 손을 깊히 넣으면 소라같은 딱딱한 우렁이 만져지고
이걸 끄내서 바구리에 담어서, 점심시간이 되기전에 부지런히 집으로 가져가면
아주머니가 물에 헹구어서 된장국에 집어 넣는다.
조금후에 부랴부랴 밥, 우렁된장국, 열무김치, 막걸리 등을 들고 논으로 나가서 어른들의 들밥으로 드린다.
물론 이때 밥들고 나가는것은 홍천댁처럼 집안의 여자들이다.
왜 홍천댁이 혼자 나갔는지... 보통 일꾼들이 많어서 집안 여자 몇명에 아이들까지 한부대가 나갔었는데...
누이들과 아낙네들은 각자 머리위에 하나씩 이고, 나는 메거나 들고갔다.
노재선 님 말따라, 충청도에서는 뭐라고 한것 같은데, "들밥"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여기에서 "어른"들이라면 사실은 젊은 20대의 장정들과 외삼촌과 같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나는 조그만 지게에 볏단 2 개만 올려놓으면 간신히 일어서서 비틀거리며 집으로 날러왔지만,
이 장정들은 지개에 한번에 볏단 20개씩 날렀다.
제일 힘든 부분은 처음에 지게메고 일어나는것... 지팽이 짚고 팔로 밀어 올리면서 간신히 일어난다.
일단 일어나면, 처음에 좀 휘청거리다가 (ㅎ, ㅎ, ㅎ.), 다음에 그저 천천히 걸으면 된다.
논에서 집까지 불과 몇백 미터였지만 볏단 메고 올때는 왜그렇게 멀었는지...
물론 내가 그런 일을 않해도 됬지만 나는 어른들 틈에 끼어서 같이 일하기를 언제나 즐겼다.그런 추억을 생각하다보면, 그때 맨발로 우렁을 잡고, 들밥나르고, 새다리에 볏짐 지던, 배고팠던
"도련님"이 나중에 미국에 와서 외과의사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래도 했을가?
그때 볏짐지고 일하던 뚝심에, 먼 훗날 배낭지고 세계의 山頂을 누비리라고는, 나조차도 몰랐었다.
돌아보면 어릴때 했던짓이 먼후 인생에 다시 나타난다. 인생은 참 모를일이다.

그리고 상추쌈이 생각납니다.
오늘 저녁은 그리 해야겠습니다.